한국도 미국처럼 '명문장 대법관' 나올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판결문체 개선 착수
짧은 문장에 읽기 쉽도록
이르면 하반기 중 실전 적용
짧은 문장에 읽기 쉽도록
이르면 하반기 중 실전 적용

미국 연방대법원 올리버 웬델 홈스 대법관이 개인의 권리 범위를 설명하며 남겼던 명(名)문장이다. 연방대법관들이 남긴 ‘판결문’은 미국의 지력이 함축된 당대 최고의 문장으로 인정받는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고 토론한 끝에 판결문을 써 내려간 결과다. 판결문을 쓰는 방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한국 대법원도 ‘읽기 쉽고 보기 좋은 판결문’ 쓰기에 발 벗고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의 문체 및 논증 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 실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달력에 중점을 두는 문장 구성, 짧은 문장을 전제로 한 연결방식이 연구된다. 중요한 내용이 맨 앞에 나오는 두괄식 체계도 적용한다. 빈번하게 적용되는 판례들은 ‘신구대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통해 읽는 이의 이해를 돕는다. 일본식 문투도 없애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간에 판결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이 생겼고 지난달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재판 판결문을 기존과 다르게 썼다”고 설명했다. 한자에서 한글로 바뀐 게 ‘2세대 판결문’이었다면 읽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이번 개선안은 ‘3세대 판결문’으로의 이행이라는 평가다.
미 연방대법원 등 선진국 최고법원의 판결서 작성 방식도 적극 반영된다. 각주를 사용하고 글씨체나 문단모양을 다르게 해 특정 내용을 강조하는 식이다. 다만 판결서 적용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도 연구해 ‘법적 해석’에 혼동이 발생하는 일은 차단하겠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대법관들이 평생 써오던 문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미 1·2심 판결문을 쉽게 쓰자고 법관들을 상대로 각종 교육을 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무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이 쌓여 있으면 ‘명판결문’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상고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업무가 줄면 미국 못지않은 ‘명문장가’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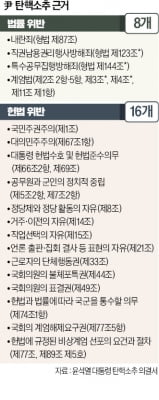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