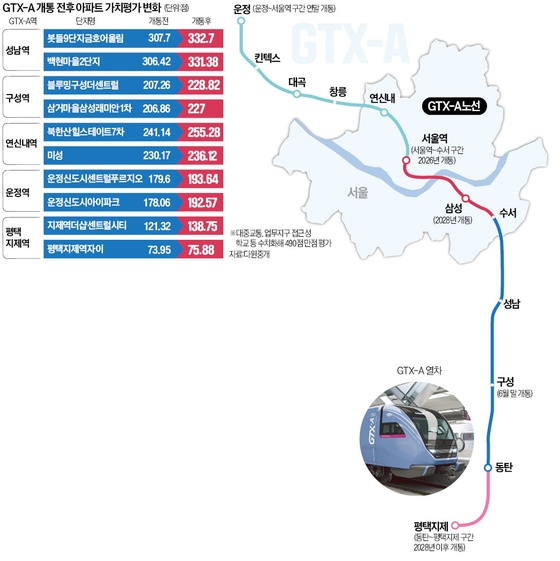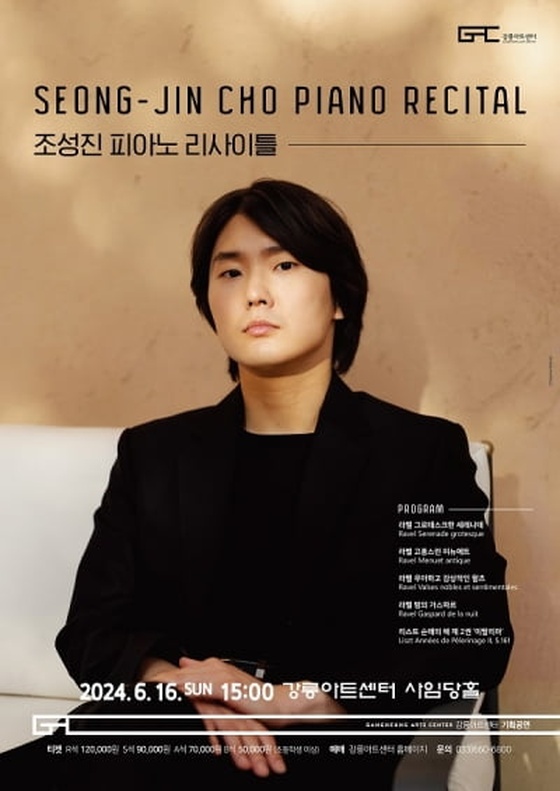[박정호의 생활 속 경제이야기] 진짜 보호무역 수단은 따로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정호의 생활 속 경제이야기] 진짜 보호무역 수단은 따로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07.14585192.1.jpg)
이 때문에 최근의 보호무역 기조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기조가 뚜렷했던 시기에도 다각적인 보호무역 조치는 항상 존재해 왔다.
![[박정호의 생활 속 경제이야기] 진짜 보호무역 수단은 따로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392476.1.jpg)
많은 국가에서 자국 내 제품에 남다른 표준을 강요하는 이유도 대부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일본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세관 절차를 악용한 바 있다. 프랑스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비디오플레이어를 특정 항구를 통해서만 들어오도록 했다. 해당 항구에 배치한 단 한 명의 세관원을 통해 모든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해 통관 절차를 지연시켰다. 당시 이런 행정적 제약으로 프랑스의 일본산 비디오플레이어 수입은 90% 가까이 감소했다.
‘홍길동 전략’도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제품명을 온전히 표기할 수 없게 하는 전략이다. 2001년 미국과 베트남 간 무역협정이 발표되면서 베트남산 메기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자 미국 메기생산협회는 미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메기(catfish)라는 생선 본연의 이름을 미국산 메기에게만 붙이도록 법안을 제정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산 메기는 같은 어종임에도 베트남식 표현인 ‘바싸’ 내지 ‘트라’로 표기해야만 했다. 독일 역시 자국 소시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자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소시지에는 ‘소시지’라는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해 왔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등과 같은 굵직한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은밀하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숨겨진 전략에도 세심히 대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정호 < KDI 전문연구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다산칼럼] 금융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7877087.3.jpg)
![[취재수첩] 美암학회에 초대받지 못한 韓 AI 신약 벤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955477.3.jpg)
![[차장 칼럼] 포기하기 전에 가볼만한 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27259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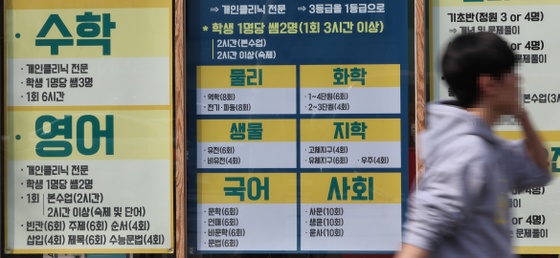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