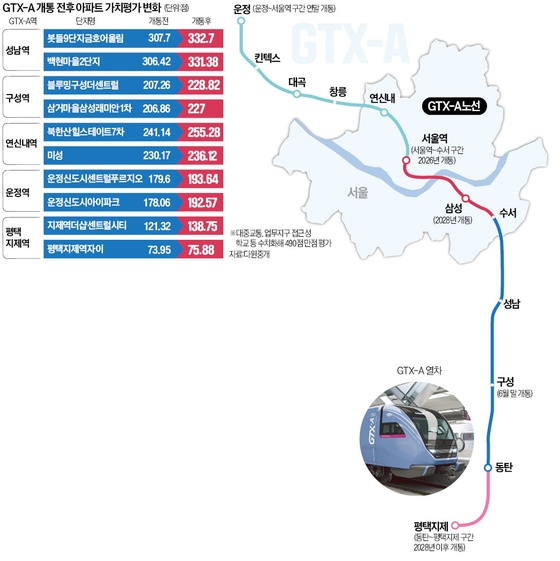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문화의 향기] "나는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업주의에 매몰돼 가는 현실 안타깝다
황주리 < 화가 >
![[문화의 향기] "나는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07.14537442.1.jpg)
우리에게도 별까지 걸어가고 싶었던, 가난하고 고독했으나 불멸의 그림으로 남은 이중섭, 박수근 같은 화가들이 있다. 나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현대의 화가들은 그림만 그리면서 별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도 가장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작가들조차 가짜 그림 시비로 결코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원작을 그대로 그려내는 인공지능(AI)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궁금해진다. 하지만 그만큼 앞선 과학의 힘으로 가짜를 가려내는 일도 조금은 수월해지리라.
가난했던 이중섭과 박수근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이 진짜라는 둥 가짜라는 둥 하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할지 상상조차 했을까? 아니 자신의 그림이 몇 십억원이라는 고가의 돈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대학 시절에 그림값이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화가 두세 명의 이름을 지금의 미술대학생들에게 물으니 거의 알지 못했다.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울해진다. 앞으로 100여 년 뒤 지금 그림값이 비싼 작가의 가격이 그렇지 못한 작가의 가격보다 비싸리라는 전망도 불투명하다. 그림이 팔려봤자 고객이 얼마 없었던 대한민국 현실에서 오랜 세월 문 닫지 않고 버텨준 화랑들에 경의를 표한다. 화가 못지않은 그림에 대한 열정을 지녔던 몇 안 되는 컬렉터와 화상들의 순정은 극단적 상업주의에 떠밀려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요즘 컬렉터 중에는 작품이 오를 거라는 화상의 부추김으로 그림을 사서 포장한 채로 창고에 넣어두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돈이 많은 컬렉터라면 이왕이면 비싼 그림으로 많이도 말고 몇 점만 사서 넣어두면 좋을 것이다. 요즘은 미술품 경매 회사의 주도 아래 그저 팔아치우려는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추정가로 내던져지는 많은 화가들의 그림이 수난을 겪고 있다. 몇 년 전의 전시회에서 정상가로 팔린, 같은 작가의 비슷한 그림이 반값 이하의 추정가로 경매에 나오기도 한다. 컬렉터라면 그런 그림들을 운 좋게 살 때인지도 모른다. 이 그림들이 또 얼마나 비싸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경매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추정가란 몇 년 동안의 개인전에서 얼마의 가격이었는가를 면밀히 조사해보고 나서 매겨야 할 것이다. 더구나 대규모 몇몇 화랑이 경매회사를 경영하는 현실이라 경매를 통해 작가의 그림값을 임의로 부풀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게 안타깝다. 이런 현상을 현대 자본주의 시장의 힘이라고, 불황을 극복하는 필요악이라고, 그저 맥없이 수긍만 하는 게 옳은 일일까? 적어도 작가 사후에나 작품이 경매에 나왔던 옛날이 그립기도 하다.
이 겨울, 어쩔 수 없이 화가인 나는 빈센트 반 고흐의 이런 말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는다. “나는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황주리 < 화가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다산칼럼] 금융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7877087.3.jpg)
![[취재수첩] 美암학회에 초대받지 못한 韓 AI 신약 벤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955477.3.jpg)
![[차장 칼럼] 포기하기 전에 가볼만한 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27259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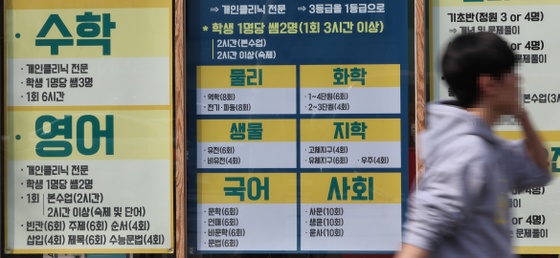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옥수수 가격 반등…에탄올 수요가 견인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5973355.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