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적폐청산' 큰 틀 정해 접근
법조계 "사건 개별성 고려해야"
작년 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최근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및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까지 이어져 오면서 중앙지검과 특검은 41건의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지난 2월 이후 서울중앙지법의 새 영장전담 판사 라인업이 심사한 건 16건으로, 6건이 발부되고 10건이 기각됐다.
수치상으로 보면 검찰 주장에 귀가 솔깃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이슈에 한정된 단편적인 결과일 뿐이다. 사건의 개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는 구속 사유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우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 △도망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이외에도 실무적으로 범죄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증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고려된다.
진행 중인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양측의 근본적 시각 차이에서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적폐청산’이라는 큰 틀을 정해 놓고 접근하는 데 반해 법원은 사건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의 입장 발표 이후 있었던 공모 KAI 구매본부장에 대한 영장은 지난 8일 저녁 발부됐다. 이것만 봐도 검찰이 항의 성명에서 언급한 ‘법과 원칙 외의 또 다른 요소’나 ‘특별한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영장전담 판사 한 명당 한 해 평균 1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여론에 편승한 듯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며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경우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도 얼마든지 유죄 선고와 법정구속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공연 연말 대목&K팝·응원봉 흥행에도…웃지 못하는 속사정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3473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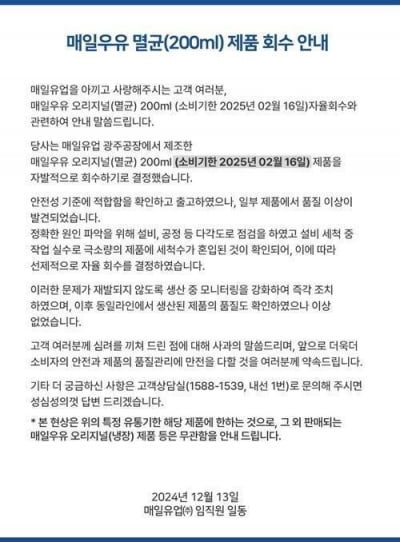





![[단독] 與, '한동훈 사살설' 김어준에 법적대응 나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3287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