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불행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 그려내
방황하는 이들의 '의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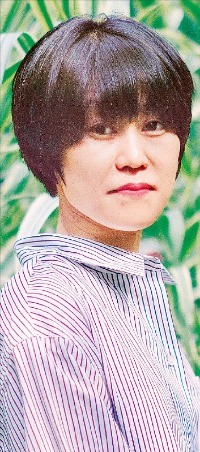
소설가 김애란(37·사진)이 5년 만에 단편소설집 《바깥은 여름》(문학동네)을 들고 왔다. 소설집 제목은 수록작 중 한 편의 제목이 아니라 ‘풍경의 쓸모’ 편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 ‘볼 안에선 하얀 눈이 흩날리는데, 구(球) 바깥은 온통 여름일 누군가의 시차를 상상했다’(182쪽)라는 부분이다. 주인공은 정교수 임용을 위해 선배 교수의 음주운전 사고를 덤터기 쓰지만 교수 임용에 실패한다. 다른 여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린 아버지는 그 여자가 많이 아프다며 주인공에게 돈을 빌리러 온다. 처한 상황은 한겨울이지만 억지로 가족과 함께 여행 간 태국의 풍경은 뜨겁게 푸르다.
“바깥과 안의 온도가 다르면 유리창에 결로가 끼듯이 그런 온도 차를 가진 인물을 그리고 싶었어요. ‘풍경의 쓸모’ 편뿐 아니라 ‘노찬성과 에반’ 편에서 찬성이 늙은 개 에반의 암 소식을 처음 들은 날 버스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 역시 8월의 녹음이 울창해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편에서 역시 명자가 남편의 부고를 듣고 영국 에든버러로 떠나는 시기도 뜨거운 여름이에요. 계절의 대비가 상실의 감정과 잘 붙겠다 싶었어요.”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작가는 특별히 사려깊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죠. 성품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곱 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저마다의 불행으로 방황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맨다. 작가는 책의 마지막 소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서 차가운 구 안에서 외로워하는 이들을 위해 문을 살짝 열어놓았다. 명자의 남편은 계곡에 빠진 학생을 구하려다 함께 숨진다. 명자는 남의 삶을 구하려고 남편이 자기 삶을, ‘우리’를 버린 것에 화가 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의 누나로부터 편지가 도착한다. 동생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과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다. ‘겁이 많은 지용이가 마지막에 움켜쥔 게 차가운 물이 아니라 선생님 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놓여요. 이기적이지요?’ 편지를 여러 차례 읽고 나서야 주인공은 ‘그 순간 남편이 무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 ‘삶이 죽음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삶이 삶에 뛰어든 게 아니었을까’.(266쪽) 자신을 두고 먼저 간 남편과 비로소 화해하는 장면이다.
“소설을 쓰다 마지막에 갑자기 발견하다시피 나온 문장이에요. 쓰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이 필요했구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가 세월호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소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아픔을 지닌 이의 공감과 위로에 기대어 명자는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고 일어선다. “첫 번째 작품인 ‘입동’에선 주인공이 주저앉아 울지만 마지막 작품에선 주인공이 일어나요. 주저앉았던 인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어설 의지를 지녔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일어서준 주인공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책마을] 고흐를 세상에 선사한 20세기 미학의 '반역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AA.43511608.3.jpg)
![[책마을] 한·일 스타 작가들이 묻는다 "무엇이 옳은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AA.4351160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