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비히 폰 미제스'자유를 위한 계획'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는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 후배 경제학자들의 스승 역할을 했다. 그가 1952년 쓴 《자유를 위한 계획(Planning for Freedom)》은 자유시장경제 이론의 ‘바이블’로 통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 가격과 임금 통제 등과 같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자유를 위한 계획은 없다"는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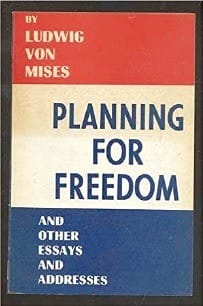
그는 이런 관점에서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을 내세우는 케인스 학파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929년 발생한 미국 대공황의 근본 원인을 유효수요 부족에서 찾았다. 공급과잉을 해소할 소비시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제스는 “공황은 신용팽창의 여파고, 대량 실업은 시장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은 임금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낳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진보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실패의 증거라고 한 모든 악(惡)들은 시장에 대한 사회 간섭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케인스 학파는 적자 재정을 통한 지출 확대 정책에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줬다”며 “그것은 전(前) 세대들에 의해 축적된 자본을 낭비하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사이비 철학”이라고 비판했다. “케인스가 범한 치명적 실수는 정부의 간섭을 용인한 것”이라는 게 미제스의 결론이었다.
인위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조성된 호황은 불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역시 미제스의 일관된 견해다. 그는 “정부는 신용팽창, 즉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심각한 실업이 생겨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과는 물가 상승, 새로운 임금 인상 요구, 또 다른 신용팽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 조치에 의해서건,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서건 최저임금이 간섭받지 않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는 순간 장시간 지속되는 대량 실업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모든 이의 임금을 인상시켜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길은 단 한 가지, 인구 대비 자본 축적 증가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추구 존중될 때 경제 발전"
그러기 위해 ‘경제적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이윤 추구가 존중될 때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전에 축적된 자본이나 기술적 지식 때문이 아니고 이 모두를 창조해내는 ‘경제적 자유’ 덕분”이라고 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선 기업가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의 일은 대중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물건을 가장 값싸게 공급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윤에 과세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 봉사한 데 대해 벌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에 대해선 “조직화된 노동자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비조직화된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낳는다”고 했다.
65년 전 미제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새 정부 출범 후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시장 개입 사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홍영식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


![[시론] 유엔기후총회와 탄소시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3027989.3.jpg)
![[천자칼럼] 개념 연예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0193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