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언각비] 'Big 3', 빅스리일까 빅삼일까
![[신아언각비] 'Big 3', 빅스리일까 빅삼일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01.13748515.1.jpg)
우리 어문규범은 아쉽지만 이런 경우까지 발음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준거로 삼을 게 없으니 어느 쪽으로 읽어도 된다. 다만 모국어 화자라면 일반적으로 3D를 삼디로 읽는 이들이 많을 것 같다. 업계에서 스리디로 한다고 해서 삼디가 비난의 대상이 될 근거는 없다.
사소한 것 같지만 시각에 따라 여기엔 거대담론 못지않은 논점이 담겨 있다. 3D를 삼디로 읽는 것은 우리말 우선주의 관점이다. 스리디는 그것을 거부한다. 말의 자연스러움을 좇는다. 고상하게 말하면 ‘언어 순혈주의 대 혼혈주의’의 논쟁인 셈이다.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세종이 ‘월月 인印 천千 강江 지之 곡曲’을 지으면서 한글을 앞세우고 크기도 한자보다 훨씬 크게 쓴 것은 우리말 우선주의의 원조 격이라 할 만하다.
2시30분은 누구나 ‘두 시 삼십 분’이라 하지만 따져보면 특이한 데가 있다. 시에는 고유어 수사가, 분에는 한자어 수사가 붙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시, 축시 하듯이 예부터 쓰던 시 단위는 자연스럽게 고유어 수사로 읽고, 나중에 생긴 분 단위는 한자어로 읽게 됐다는 게 정설이다.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방식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이라면 3D는 영어식으로 읽는 게 편하다.
우리말에서 숫자와 결합한 영어 표기가 본격 등장한 것은 대략 외환위기 때부터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속에 ‘빅(Big)3’란 용어가 떠올랐다. 이를 ‘빅삼’보다 ‘빅스리’로 많이 읽는다. 그렇다고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예전에 M1 소총은 ‘엠원’이라 했지만 나중에 나온 개량형 M16은 ‘엠십육’이라 불렀다.
사회언어학자인 김하수 전 연세대 교수는 “이런 차이는 윤리나 언어 원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습과 취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디든 스리디든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인위적인 지침보다는 ‘언어의 자유시장’에 맡겨 언중이 선택하게 하는 게 최선이다. 오늘은 ‘대선 D-18’이다. 이것은 디에이틴일까 디십팔일까. 답은 독자들이 갖고 있다.
홍성호 기사심사부장 hymt4@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26조원과 5만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86123.3.jpg)
![[데스크 칼럼] 부천 시민들이 부러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0116591.3.jpg)
![[다산칼럼] 바보야,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였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226013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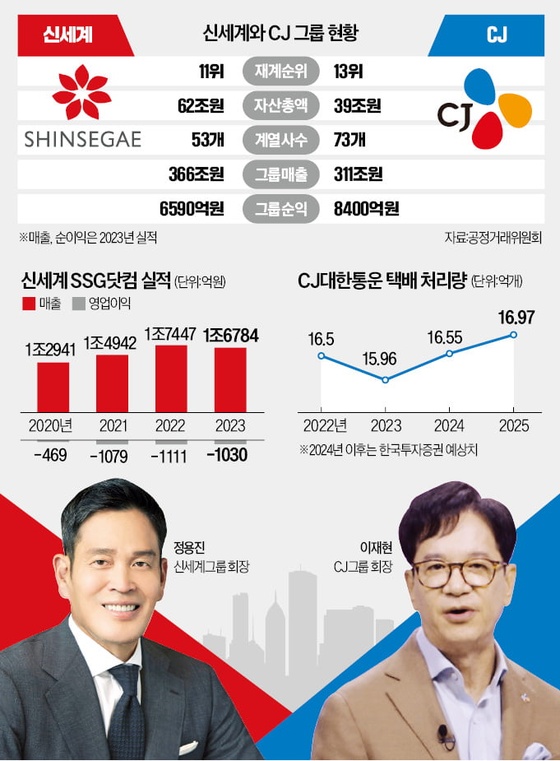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서울시향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444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