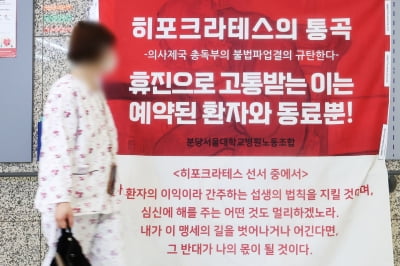인원·예산 놓고 이견 팽팽…세월호 특조위 7월 운명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측 파견 공무원이 내부 설명회를 열어 활동 종료 시점으로 통보된 30일 이후 어떻게 특조위가 운영될지 설명하려 했으나 민간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조위 내분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개정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특조위 활동 기한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정직 공무원 임기를 비롯한 인원 감축 분야이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면 다음 달부터는 종합보고서·백서 발간 활동이 시작된다고 보고 기존 인력의 80%가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나머지 20%는 특조위에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원소속 부처로 복귀하는 파견 공무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이 활동을 계속하려면 임명권자인 특조위원장이 업무 연장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
별정직 공무원을 특조위에 채용할 때 임용 기간을 '조사활동 시기'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석태 특조위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이 위원장은 연장명령을하지 않겠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직 공무원 업무 연장명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내년 2월까지 보장돼야 한다는 '명분'과 맞지않고, 업무 연장명령을 내리면 스스로 활동 기한을 '올해 6월'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보인다.
앞서 특조위는 활동 기간을 둘러싼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6월 말 활동 종료를 통보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예산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 측은 30일로 조사활동이 종료되니 특조위에 보고서·백서 발간에 필요한 예비비를 신청하라고 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가 활동 기간인 만큼 올해 말까지 필요한 예산은 이미 정부에 신청했고, 별도의 예비비 편성이 필요 없다고 맞선다.
이들 쟁점을 놓고 정부와 특조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인력운용 방안을 원칙대로 해석하면 별정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고 당장 조사활동은 물론 특조위 사무실 출입 자체도 불허될 수 있다.
정부와 특조위는 30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접점을 찾으려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서 상황이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측 관계자는 "30일까지 별정직의 업무 연장명령이 없으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용공고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특조위의 한 별정직 공무원은 "특조위 활동 기간조차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활동을 종료시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서울 최고 핫플" 2030 극찬했는데…"이럴 줄은" 충격 실태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564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