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면 취업하자는 생각은 창업 실패하는 지름길
5년 버틸 각오로 도전해야"
2011년 미팅 커플앱 등 개발
성균관대 출신 이주광과 2014년 에이프릴스킨 공동창업
빙하수 등 천연원료 사용…SNS '감각적 마케팅' 주효

김 대표는 12일 “올들어서만 100억원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며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온라인몰을 지난해 말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14일 열리는 연세대 13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연세창업대상’ 학생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에이프릴스킨은 설립 첫해인 2014년 천연비누 ‘매직스톤’을 내놓았다. ‘쌩얼비누’라는 별명이 붙은 이 비누는 세안만으로 여드름, 각질, 모공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시된 지 3주 만에 온라인에서 월매출 1억원을 넘었다. 에이프릴스킨은 이어 미백크림인 ‘매직스노우크림’, 메이크업 제품인 ‘매직스노우쿠션’ 등을 잇따라 선보여 히트를 쳤다.
김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최대한 활용해 주 구매층(10~20대)에 다가가는 마케팅 전략을 썼다. 그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SNS를 홍보채널로 이용한다”며 “SNS 유명인들을 모델로 내세워 이 모델을 따르는 팔로어들도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SNS 유명인들은 단순히 얼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접 제품을 써본 뒤 사용 후기도 올린다.
상품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팀을 합류시키는 것도 성공 요인 중 하나다. 화장품은 팬층을 두텁게 해 재구매를 유도해야 성공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김 대표는 “대기업은 주로 화장품을 생산한 뒤 홍보 방안을 찾지만 우리 마케팅 직원들은 처음부터 상품 제작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쉽게 부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젊고 화장품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회사 직원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자발적으로 제품을 테스트하고 꼼꼼하게 장단점을 분석한다. 김 대표는 “채용할 때부터 소위 ‘코덕’(코스메틱과 덕후의 합성어, 화장품 마니아) 위주로 뽑다 보니 직원의 87%가 여성”이라며 “화장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아 제품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이상 버틸 끈기와 인내 중요”
김 대표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김 대표는 2011년 휴학하고 창업에 도전했다. 2012년엔 국내 최초로 대학인증 미팅서비스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미스터미세스’라는 청춘 커플용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화장품 제품의 판매대행업도 해봤다. 김 대표는 “일부 앱이 잠시 상용 서비스되기도 했지만 실패하거나 싼값에 팔았다”며 “빚이 3억원 넘게 늘어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적도 있다”고 떠올렸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 사무실 임차료를 낼 돈이 없어 카페나 구청이 지원하는 창업공간을 이용하기도 했다. 화장품 제조에 눈뜬 것은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경력을 쌓은 공동대표 이씨를 만나고 나서다. 2014년 초 사업차 만난 이 대표와는 서로 걸어온 길이 비슷했고 그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그는 이 대표와 함께 전국의 비누 장인들을 만나 연구를 거듭한 끝에 천연 비누를 개발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먼저 명성을 쌓은 뒤 중국에 진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5년은 참고 견디겠다는 ‘각오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동료 창업자들을 보면 대부분 창업 3~5년차 이후 매출이 급증하는 사례가 많다”며 “스타트업은 매출이 서서히 느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임계점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하다 안되면 취업해야지’라는 자세로 일하다 보면 ‘마(魔)의 5년’을 버티기 힘들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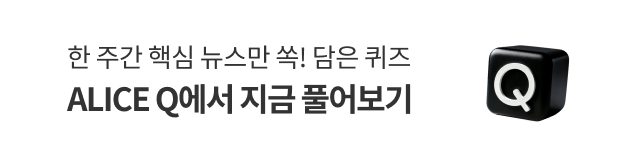

![[포토] 국회 앞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394603.3.jpg)
![[포토] 또 다시 멈춰선 한강버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39415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