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내용은 더욱 충격이었다. 토론회에는 정해진 순서도 준비한 멘트도 없었다. 서로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었고, 거침없이 상대방 의견을 반박했다. 덴너 CEO는 폭스 장관에게 “자율주행차를 위한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문제는 규제와 인프라다. 자율주행차를 실험할 도로도, 폭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인프라도 없다. 정부는 대책이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폭스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율주행차가 어떤 단계를 거쳐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덴너 CEO가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면 무인 주차가 가장 먼저 현실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샤수아 CTO가 “그런 건 전혀 재미없다”며 “자율주행차를 ‘우버’처럼 공유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덴너 CEO의 얼굴이 민망함으로 일그러졌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오고 갔다.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다 불현듯 한국의 정부·기업인 간 토론회가 생각났다. 이름표를 단 경직된 얼굴의 기업인들, 정해진 순서, 정해진 발언, 뻔한 결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의견을 개진하는 대기업 CEO와 중소기업 창업자가 한자리에 있는 CES의 토론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만 떠올랐다.
자율주행차 기술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 2~3년 뒤면 자율주행차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 인류의 삶을 지금보다 낫게 하느냐다.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고 창의성이 관건이다. CES 토론회는 구글과 우버를 만들어 낸 ‘창의대국’ 미국의 힘을 느끼게 해 줬다.
남윤선 산업부/라스베이거스 기자 inkling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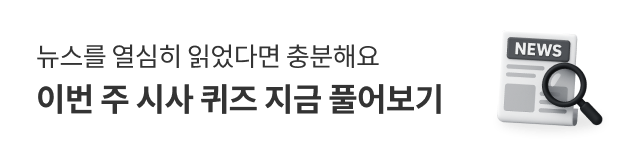
![[기고] 피지컬 AI, 대한민국 AI 전략의 돌파구](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42702681.3.jpg)
![[한경에세이] 작은 손길 모여 더 따뜻한 도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42631885.3.jpg)
![[백광엽 칼럼] 기업 유보금 80조 '증시 살포 유도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350908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