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호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개혁은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짙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일반해고 등 핵심사안은 중장기 과제로 돌릴 수 있다는 중재안을 노동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도 최근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며 이 두 가지는 수용불가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시한이 정해져 있는 협상이라는 점도 졸속 타협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난달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을 제1 개혁과제로 강조한 이후 고용부는 9월 중에는 끝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9월10일까지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간이 노동계 편이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경제계는 차라리 노사정위를 깨더라도 정부가 이번 기회에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호소한다.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일반해고 등 핵심쟁점에 대해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통상임금만 해도 바로 정부 지침에 따라 해오다가 탈이 났던 것이다.
노동개혁은 고용시장을 제대로 돌게 하자는 게 원래 취지지만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되면서 진지한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좌파정부에서조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성론이 일고 있는 프랑스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타협을 목표로 한 노사정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그라진다. 태생적인 한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야 의미가 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몰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토요칼럼] 저금의 재발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424728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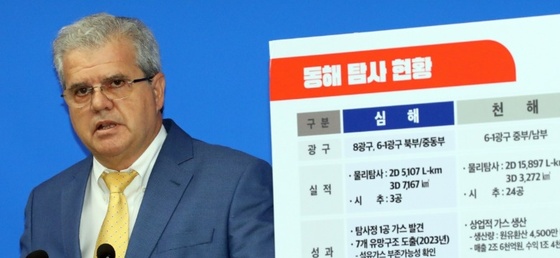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뉴욕증시-주간전망] 연준, 물가 보고서와 애플](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7517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