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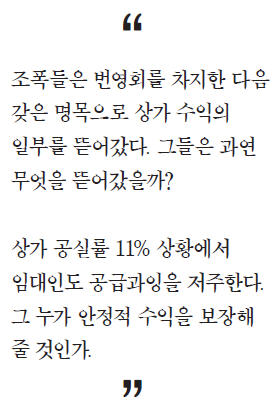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을 법제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최근 발표됐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게 비친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은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적대적, 영합적 (零合)관계가 아니다. 전체 상가 계약의 3% 수준에서 분쟁이 발생한다지만 3% 아닌 30%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상인과 임대인의 이익의 방향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외견상으로는 한쪽의 큰 이익이 다른 쪽의 작은 몫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이부터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같다. 임대료는 업황의 지표이면서 동시에 사업전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적자를 보면서도 강남역 사거리에 깃발 점포를 내는 것조차 그렇다. 이들 점포는 “우리는 고객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백화점 입점 업체도 굳이 로드숍을 낸다. 트리클다운하는 후광효과를 노린 것이다.
빌딩 가격은 기대 임대료 수입 총액의 현재 가치다. 임대인도 시장가격의 수용자(price taker)다.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상업용 임대빌딩은 114만3000동이다. 이 빌딩들을 임차상인들이 다 채우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현재 상업용 빌딩의 공실률은 10.3%다. 단순계산으로 11만채나 비어 있다. 2011년 7% 선을 바닥으로 그래프는 가파른 상승세다. ‘어딜 가도 공급과잉!’이라는 푸념은 임대인에게도 성립한다. 부동산 투자의 종착역이 상가투자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거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매장 임대수익률은 연 5%다. 2011년 6.5%에서 2012년 5.25% 2013년 5.15%로 낮아지고 있다. 빌딩 가격의 하락까지 감안하면 더 낮아진다. 공실률이 10% 이상인 상황에서 임대와 임차의 힘의 관계는 쉽게 역전된다. 최근에는 몇 개월치 렌트프리를 줄 것인지를 놓고 임대인은 한숨을 쉰다.
상가주인은 지역상권까지 고려하면서 상가의 구성을 기획한다. “자연은 그 자체로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그것에 노동을 투입하여 무언가를 생산하게 되면 그 자의 소유물이 된다”고 존 로크는 썼다. 그렇게 기획력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 영업권리금은 상인들 간에 땀의 가치를 거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영(零)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보호될 수 없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착취한다면 임대인은 은행에 착취당한다. 은행은 또 빌려준 사업자금을 떼인다. 그렇게 인생도 사업도 고단하다. 그러나 모두가 한 배를 탔다. 그러니 정부는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라.
정규재 논설위원실장 jkj@hankyung.com


![[한경에세이] 옷을 뜯어먹는 염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8510855.3.jpg)
![[아르떼 칼럼] 한 테이블에 앉은 영국인과 중국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8863970.3.jpg)
![[천자칼럼] 3차 핵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86385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