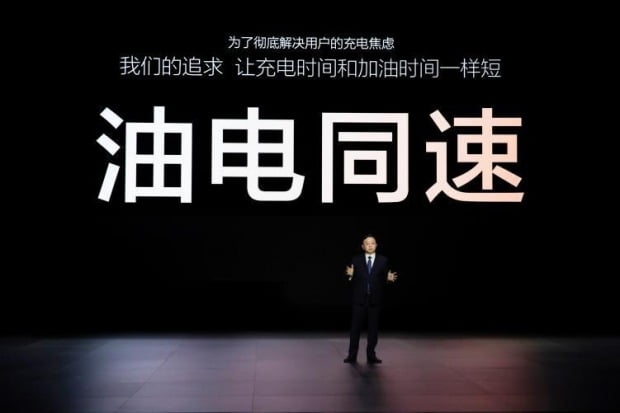디스플레이 '기술 리더' LG디스플레이, 구리배선 LCD·100인치 패널·FPR 3D 패널…'세계 최초' 제조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Cover Story - LG디스플레이

2000년 20.1인치 TV용 LCD 개발을 시작으로 HD TV용 52인치 패널(2002년), 구리배선 기술을 적용한 LCD(2002년), 100인치 패널(2006년), 19인치 플렉시블 전자종이(2010년), 필름편광패턴(FPR) 3D 패널(2010년) 등이 세계 최초 혹은 최대 수식어가 붙는 기술들이다. 2011년에는 LG그룹 차원에서 승부수를 띄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용 패널을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한발 앞서게 됐다.
LG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세계 1위(월간 기준)에 오른 것은 2002년 8월. 그해 4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구리배선 기술이 한몫했다. TV 모니터 등 글로벌 세트 업체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 패널 주문량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디스플레이업체들은 그전까지 크롬 몰리브덴 알루미늄합금 등을 배선재료로 썼다. 당시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고 전기저항이 거의 없는 데다 알루미늄합금의 절반 가격이어서 ‘꿈의 재료’로 불렸다. 하지만 화학약품에 쉽게 변질되고 습기에 약한 약점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개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LG디스플레이는 구리배선이 가져올 LCD 기술의 혁신에 주목했다. TV 등의 화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전기신호 왜곡을 줄여 미세한 화면떨림 현상을 해결할 핵심 기술로 구리배선 기술을 지목했다. 꼬박 5년6개월을 매달린 끝에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쟁사들은 2010년이 돼서야 뒤늦게 구리배선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LCD가 빠르게 대형화되면서 기존 기술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발 앞서 구리배선 기술을 확보한 LG디스플레이는 대형 LCD시장의 최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
LG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은 액정 방식에서도 입증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LCD는 PC 모니터뿐 아니라 TV로 확대됐다. 시야각을 넓게 해주는 액정기술이 핵심 기술력으로 떠올랐고 기술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일었다. 삼성, 샤프 등 대다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화질과 잔상 등의 문제는 있지만 양산이 용이한 VA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LG는 과감하게 ‘나홀로’ 길을 선택했다. 일본 히타치가 실패했던 IPS 방식의 양산 기술 확보에 뛰어든 것. VA는 액정 분자를 나란히 세우기만 하는 반면, IPS는 분자가 누운 채로 반응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시야각은 넓지만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기술이었다.
LG디스플레이로서도 액정 분자의 배열 구조를 바꾸는 작업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닥쳤다. 그러나 앞서 가기 위해선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4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2000년 4월 세계 최초로 IPS 대량 양산에 성공했다.
IPS에서 한발 더 나아가 스마트폰 등 소형 기기에 특화된 액정 기술인 AH-IPS 기술도 확보했다. 아이폰의 레티나로 더 유명해진 패널 기술이다. 시야각이 뛰어나고 화질이 선명하면서도 반응 속도가 빨라 터치 패널에 적합한 AH-IPS는 LG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파트너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차세대 TV로 불리는 OLED TV용 패널도 LG가 확보한 앞선 기술이다.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대형 OLED 패널을 양산하는 곳은 LG디스플레이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도 양산을 포기했을 만큼 대형 OLED에서는 LG가 앞서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