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최소한 알권리 보장을"
병원 "불필요한 불안감 조성"
정부 "2015년까지 공개 의무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국민들이 CT를 찍을 때마다 정부가 피폭량을 누적, 관리해 개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내년쯤에는 엑스레이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개인별 방사선 관리에 나선 것은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피폭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진단용 방사선 검사 건수는 2007년 1억6000만건에서 2011년 2억2000만건으로 늘었다. 국민 1인당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연간)도 같은 기간 0.93mSv에서 1.4mSv로 급증했다. 피폭량 1.4mSv 중 56%(0.79mSv)는 CT가 원인이다. 정기 건강검진이 일상화하면서 CT 촬영 등이 보편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방사선 관리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선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월 이후 1500여개 전국 CT기기 비치 병원 가운데 400여곳이 식약처가 배포한 방사선 측정기를 무료로 받아갔다.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은 물론 지방의 작은 병원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피폭량을 측정하더라도 환자에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에는 매일같이 환자들의 민원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CT를 찍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환자가 CT를 찍을지 엑스레이(방사선량이 CT의 50분의 1)를 찍을지 선택권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해놓고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원 측은 CT 피폭량을 공개할 경우 환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승은 가톨릭 의대 교수는 “CT 촬영 때마다 피폭량을 기록하고 신경쓰게 된다면 결국 방사선 누적이 두려워 필요한 검사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정부가 환자를 개별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 의료기관을 믿고 관리를 맡기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정부의 피폭량 관리사업이 CT 촬영의 필요성보다는 위해성을 부각해 검사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사선 관리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이 CT 촬영을 통해 병원 수익을 늘리려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가 자신의 피폭량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감을 갖는다거나 필요한 CT 촬영을 거부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높아진 국민의식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늦어도 내년까지 병원들의 방사선 피폭량 관리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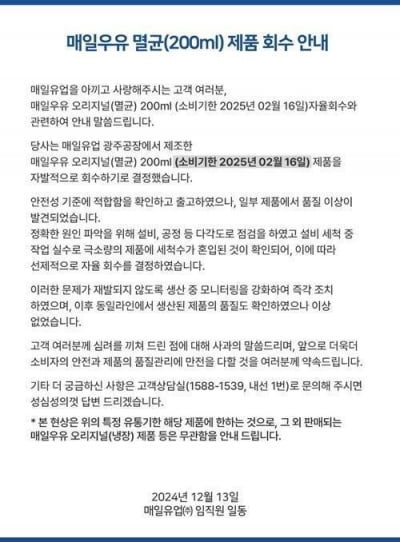

!["하루 2시간씩 한다" 한강이 공개한 루틴…내게도 효과 있을까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16642.3.jpg)




![[단독] 與, '한동훈 사살설' 김어준에 법적대응 나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3287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