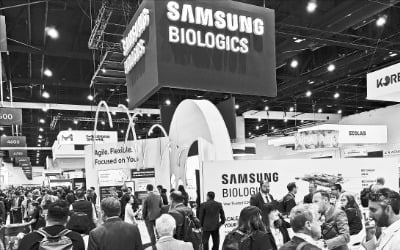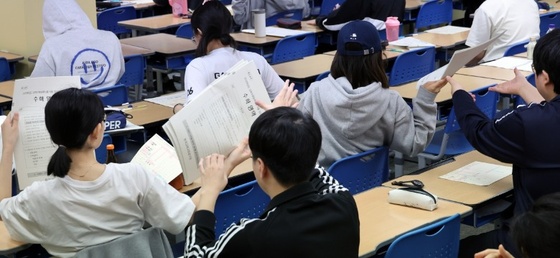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이런 것이 창조경제'…진화 거듭하는 SXSW
교열 기자인 롤런드 스웬슨(당시 31세)은 에디터인 루이스 블랙과 발행인인 닉 바바로에게 대뜸 "오스틴에서 가요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오스틴이 남부 촌구석이긴 하지만 텍사스대 본교가 있는 자유분방한 대학도시이고 비즈니스 환경도 좋아 잘하면 장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세 사람은 "일단 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가요제 이름은 '남부로 가자'는 뜻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South by SouthWest)로 정했다.
스릴러 영화의 거장 앨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작품인 '노스 바이 노스웨스트'(North by NorthWest)를 패러디했다.
SXSW는 그렇게 무모하게 시작했지만 기대 이상의 흥행을 기록했다.
1987년 첫 대회를 앞두고 "150명만 오면 대성공"이라며 가슴을 졸였지만 700명이 오스틴을 찾아 '대박'을 터트렸고, 이후 관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텍사스의 해방구'라는 진보 성향의 지역 정서와 얼터너티브 록에 대한 젊은이들의 갈증이 빚어낸 현상이었다.
축제는 흥행을 거듭했지만 창업맨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
1994년 영화와 멀티미디어 콘퍼런스로 분야를 넓혔다.
1999년 멀티미디어에서 이름이 바뀐 인터랙티브는 전 세계 IT 기업과 벤처 창업가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음악을 넘어서는 대표 장르로 발돋움했다.
2007년 트위터, 2009년 위치기반 SNS인 포스퀘어가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것도 인터랙티브 콘퍼런스였다.
2008년에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콘퍼런스 대표 인터뷰에 나섰다.
SXSW는 예술에 기술이 접목된 미래산업의 메카가 됐지만 신세계를 향한 실험은 계속됐다.
업계 관계자가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콘퍼런스 산하에 교육, 환경을 신설하더니 올해에는 의료와 우주개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오스틴 밖인 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 벤처창업을 대상으로 한 SXSW 벤처비전(V2V : Vision to Venture)이 열렸다.
SXSW은 정치권도 영향권에 넣었다.
올해에는 위키리크스 창시자인 줄리언 어산지와 미국 정보기관의 전방위 불법 감청 실태를 고발한 데이비드 스노든이 인터랙티브 무대에 등장했다.
미국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딸 첼시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이 오스틴을 찾은 것은 SXSW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도무지 끝을 모르는 SXSW의 진화 덕에 오스틴에선 막대한 부가 창출되고 있다.
12일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에는 인터랙티브 관객 3만명 등 7만명이 몰려 지역경제 파급효과만 2억달러(2천130억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랙티브 콘퍼런스에서 성사된 인터넷 기반 창업 지원액만 5억달러로 알려졌다.
오스틴은 인구 수에선 휴스턴, 댈러스, 샌안토니오에 이어 텍사스 내 4위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포브스 등 경제 전문지 평가에서 '가장 성장하는 도시', '최적의 비즈니스 도시', '최고의 IT 기반 창업 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스웬슨을 비롯한 창업 3인방의 부단한 창조와 혁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SXSW가 음악의 정체성을 잃고 '돈 먹는 괴물'이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스웬슨은 행사 개막 인터뷰에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비난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SXSW가 진화를 멈춘다면 곧 시들어 죽게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는 환갑을 앞둔 중년 남성이 됐지만 올해도 대회 운영 감독을 맡아 '변화의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오스틴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jahn@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