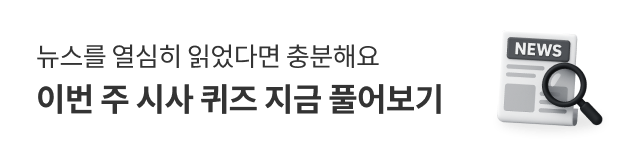가솔린 엔진은 연소실 내부에서 점화 플러그가 일으킨 불꽃이 연료를 태워 불이 붙는다. 반면 디젤은 연료에 혼합된 공기를 압축하면서 발생한 열로 불을 붙이는 압축착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솔린과 디젤의 발화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활한 압축착화가 이뤄지려면 실린더 내부가 가열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예열이다. 예열은 계기판 내 돼지 꼬리 모양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열쇠를 차에 꽂고 'ON' 위치에 두면 나타나고, 표시가 없어지면 예열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예 돼지꼬리 아이콘이 뜨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열 플러그 온도가 0.5초 만에 1,500˚C 까지 오를 수 있도록 소재로 세라믹 등을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우 추운 날씨가 아니라면 예열은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보통 시동 이후 공회전 단계까지 예열로 분류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회전은 '준비운동(워밍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디젤 엔진의 경우 가솔린 엔진보다 무겁고, 터보차저 등을 장착한 만큼 추운 날씨에 워밍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일이나 냉각수 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고, 엔진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준비 운동 없이 격렬한 운동할 경우 신체에 큰 부하가 걸리는 일과 똑같다.
공회전은 정해진 시간이 없다. 기온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 오염이나 효율 저하를 부른다는 점에서 일정 시간 이상은 권장되지 않는다. 차라리 시동이 걸린 후에 차를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통 5㎞ 이하의 거리를 적은 엔진 회전수로 이동하는 방법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열은 자동차 운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주행 후 터보차저가 장착된 디젤 엔진은 터빈이 고압에서 작동하면서 열이 발생한다. 이 때 갑자기 엔진을 멈추면 터빈이 순간적으로 냉각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 터빈을 안정적인 상태로 두는 것이 후열이다.
일반적으로 도심 주행에선 터빈이 높은 압력과 고열에 시달리지 않는다. 따라서 차를 가혹하게 다루는 고속 주행 환경에서 후열이 강조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접어들 때 속도가 줄면서 엔진 회전도 줄어 후열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후열에 대한 신경을 크게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고속도로 등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들린 휴게소에서 엔진을 멈추는 경우다. 물론 휴게소에 진입할 때 감속으로 후열 과정이 생기지만 불안하다면 정차 후 10~20초 정도 기다려도 나쁘지 않다. 몰론 최근 자동차들은 스스로 엔진 상태를 실시간 측정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지했을 때 최적 시간을 찾는다. 데이터가 모이면 운행 패턴에 따라 후열 시간을 조절하기도 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