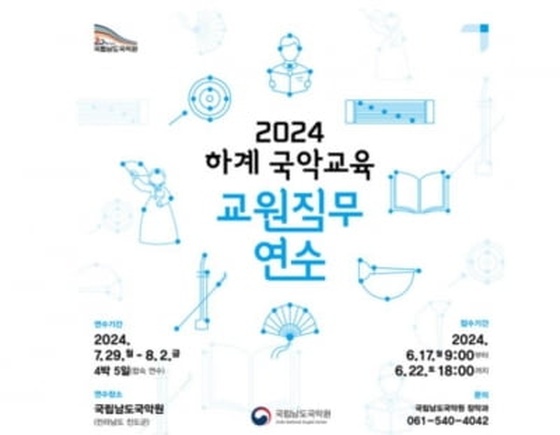[한경에세이] 사택(舍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행히 물질만 좇으며 살진 않았구나"
최백호 < 가수·한국음악발전소장 >
![[한경에세이] 사택(舍宅)](https://img.hankyung.com/photo/201312/AA.8144110.1.jpg)
어릴 적 어머님을 따라 학교사택으로 이사를 다녔다. 사택이란 게 그곳에서 사는 아이들에겐 묘한 느낌의 곳이었다. 우리 집인데도 우리 것이 아닌, 그렇다고 주인 눈치 보는 셋방살이는 아니어서 조금은 편했던, 그러나 한 번도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다 떠난 선생님 아이들의 낙서가 가득한 벽이며 구멍이 숭숭 난 부엌 벽들은 뭔가 기대를 가지고 놀러 온 같은 반 아이들에겐 좀 부끄럽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다.
그래도 새로 이사를 가면, 뚫린 문풍지는 얇은 달력종이로 발라 막고, 천장의 쥐구멍도 때우고 흙이 드러난 벽은 어머님이 학교에서 가져온 신문지로 도배도 하고, 같은 사택에 사는 아이들과는 눈치 봐 가며 ‘형’이라고 부를지 동무가 될지도 익혀가고 좀 거친 아이가 있으면 되도록 피해가며 1학년, 6학년, 중학생들이 되어 갔다.
‘선생님 아~들(애들)’은 비슷한 환경, 같은 문화권이라 그런지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 성적과는 상관없이 약간 공부를 잘할 것 같고, 약간 모범생인척하려 했고, 약간 멋을 덜 부리고 튀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두어 보호하려 하고 되도록 부딪치지 않으려 했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그 시절 주먹 좀 쓰던 친구 녀석도 “그땐 니가 선생님 아들이라 내가 좀 봐줬지” 하고 뒤늦은 공치사를 하기도 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그 밥그릇은 무엇으로든 채워질 게 아닐까? 물질이 풍족하면 그것으로, 아니면 또 다른 것들로….
그 궁핍했던 시절이 오히려 낭만적이었다고 느껴지는 건 내 밥그릇에 다행히 물질만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더 많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최백호 < 가수·한국음악발전소장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선제적 아닌 '눈치보기' 통화정책…Fed는 왜 필요한가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9263091.3.jpg)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