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선박 덤핑계약…조선 수주, 건설사 '닮은꼴'
1993년 세계 수주량 1위에 올라선 한국 조선업계는 2000년대 들어서도 승승장구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호황을 가져다줬던 중국의 고속 성장이 멈추고 유럽이 재정위기로 흔들리면서 조선 수요가 급감했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2006~2008년 연평균 700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기록한 세계 선박 발주는 2010년 이후 연간 3000만CGT 수준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조선사들은 배를 만드는 도크를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싼 가격에라도 수주할 수밖에 없었다. 배를 만드는 데는 통상 2~3년 걸린다. 2010년 이후 저가 수주한 물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조선사 실적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올해 실적 악화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작년부터 드릴십 등 고부가가치 해양 플랜트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셰일가스 개발에 맞물린 LNG선과 해양 플랜트를 중심으로 수주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올해 연간 목표액 60억달러의 85%가량인 51억달러를 수주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이 채권단 공동 관리를 받는 등으로 인식이 더 나빠졌지만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내년 이후 실적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사들은 한동안 실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적 악화가 해외 시장 저가 수주와 국내 주택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상협 동양증권 연구원은 “과열됐던 2010~2012년 중동 수주 시장은 장소만 다를 뿐 2006~2008년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과 비슷했다”며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영업 목표를 달성했던 것이 결국 지금의 실적 악화로 되돌아왔다”고 분석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업체 간 경쟁이 ‘제살깎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해외 수주액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수익성 확보가 안 되면 부실만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욱진/안정락 기자 ventur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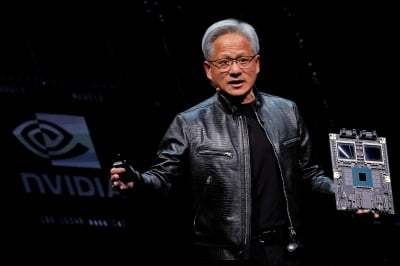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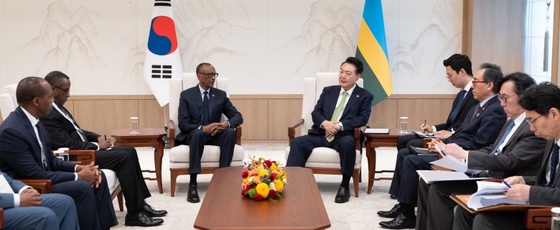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