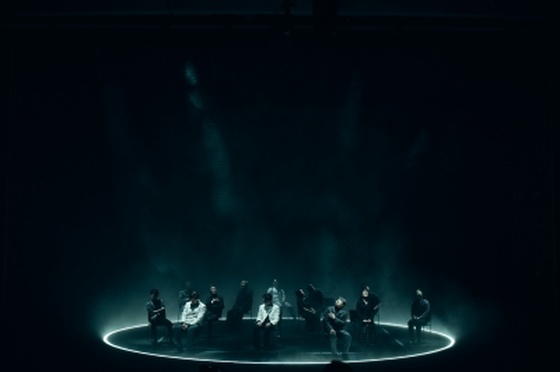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사설] 韓國 핵심산업 기로에 섰다는 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은 단순한 희망퇴직이 아니다. 유럽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조선 불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현대중공업의 수주량은 82억달러로 올해 목표액 240억달러의 34.2%에 불과했다. 울산조선소의 지난달 말 기준 수주잔량도 476만1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100척)로 역대 최고치의 3분의 1도 안 된다. 세계 1위 조선업체마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포스코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철강수요 부진과 과잉공급의 직격탄을 맞았다. 세계 철강사들의 인수·합병이 한창이다. 독일 최대 철강업체 티센크루프는 해외 제강소 매각을 추진 중이고, 일본 1, 3위인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금속은 합병을 통해 세계 2위 철강회사를 출범시켰다. 생존의 출구를 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석유화학도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국내 유화업체들이 텃밭으로 여겼던 중국시장에서 중동 기업들의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셰일가스를 앞세운 미국 가스화학산업의 부활까지 점쳐지면서 유화업계도 재편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건 전자와 자동차뿐이다. 그러나 이들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 신흥시장에서는 무역규제에 시달리고, 선진국 시장에서는 특허공세 등 노골적인 견제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게다가 선진국들의 잇단 양적완화 정책 속에 이제는 원화강세 부담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통령 선거에 한눈 팔린 사이 한국 주력산업들이 총체적으로 벼랑에 선 형국이다. 대선후보들은 이 비상 상황이 안중에도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교육혁신, 사라지는 연수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아르떼 칼럼] AI가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036337.3.jpg)
![[천자칼럼] 30년 만에 수출 꿈 이룬 K고속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361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