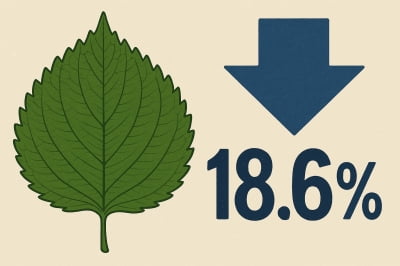[시론] 나라발전 방정식 '개방형 혁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학·기업·정부 간 융합이 요체
개방·협력위해 '적과의 동침'도
국가차원에서 시스템 구축해야
이준승 <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개방·협력위해 '적과의 동침'도
국가차원에서 시스템 구축해야
이준승 <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
지난 6월 말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혁신경영전문학회(ISPIM·International Society for Professional Innovation Management)에 다녀왔다. 혁신 관련 연구에서 ISPIM은 그 권위와 네트워크 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조직이다. 올해도 ‘개방형 혁신’의 창시자인 미국의 헨리 체스브로 UC버클리 하스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55개국에서 5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혁신 이론과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몇 년째 ISPIM 콘퍼런스의 주요 화두는 단연코 ‘개방형 혁신’이다. 올해 발표내용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글로벌 경쟁기업 간 연구·개발(R&D) 협력 사례였다. 대표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인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미국의 존슨앤드존슨은 최근 바이오분야 연구에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폐쇄적인 기업 내 R&D만으로는 더 이상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던 것이다. 경쟁기업들이 소위 ‘적과의 동침’을 통해 공동 R&D를 시도한다는 소식은 ‘개방과 협력’만이 살 길이라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개방형 혁신은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로도 인식할 수 있다. 국가혁신체계 측면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개별 주체들의 새로운 지식 창출, 확산, 활용이 극대화돼야 한다.
또 국가적 혁신을 위해서는 전체를 조망하고 아우르는 거시적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특정 학문, 조직, 기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미시적 관점의 혁신이 아닌, 이를 통합적으로 융합하는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혁신을 꾀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여러 분야가 단순히 연관된 통합에서 나아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종 간 융합이 필요하다. 단순 합(合)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의미있는 변종을 탄생시키는 학문 간, 분야 간, 기업 간, 조직 간의 합종연횡이 필요하고 이는 개별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과 비전을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개방형 과학기술정책도 개방형 혁신과 맥을 같이한다. 기존의 관료와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던 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국가 과학기술 체계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자원부국 카자흐스탄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영토대국이면서 자원 가채매장량 부문에서 우라늄 세계 2위, 석탄 세계 7위, 원유 세계 9위, 천연가스 세계 18위에 이르는 자원대국이다. 인적자원이 최대 자산인 우리와는 달리, 카자흐스탄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천연자원’이었다. 이제는 또 다른 국가 발전 방정식을 찾기 위해 역시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지난 40년간 고속성장을 경험한 한국의 R&D시스템과 노하우를 통해 국가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국가적 차원의 기술예측, 미래 전략기술 도출, R&D 사업체계 설계 등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혁신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한국도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성공모델, 발전 방정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우리의 발전 방정식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노력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국가 혁신 틀을 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ISPIM 혁신 심포지엄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위한 자리다. 전 세계 혁신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혁신 사례를 경청하고, 그들의 혁신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이번 혁신 심포지엄을 계기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라는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가혁신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상생과 파트너십을 통한 국가 혁신 주체들의 ‘개방과 협력’이 기본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준승 <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jslee@kistep.re.kr >
최근 몇 년째 ISPIM 콘퍼런스의 주요 화두는 단연코 ‘개방형 혁신’이다. 올해 발표내용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글로벌 경쟁기업 간 연구·개발(R&D) 협력 사례였다. 대표적인 글로벌 제약회사인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미국의 존슨앤드존슨은 최근 바이오분야 연구에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의 폐쇄적인 기업 내 R&D만으로는 더 이상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던 것이다. 경쟁기업들이 소위 ‘적과의 동침’을 통해 공동 R&D를 시도한다는 소식은 ‘개방과 협력’만이 살 길이라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ADVERTISEMENT
또 국가적 혁신을 위해서는 전체를 조망하고 아우르는 거시적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특정 학문, 조직, 기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미시적 관점의 혁신이 아닌, 이를 통합적으로 융합하는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혁신을 꾀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여러 분야가 단순히 연관된 통합에서 나아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종 간 융합이 필요하다. 단순 합(合)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통해 의미있는 변종을 탄생시키는 학문 간, 분야 간, 기업 간, 조직 간의 합종연횡이 필요하고 이는 개별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과 비전을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개방형 과학기술정책도 개방형 혁신과 맥을 같이한다. 기존의 관료와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되던 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ADVERTISEMENT
이제 한국도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성공모델, 발전 방정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우리의 발전 방정식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노력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국가 혁신 틀을 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ISPIM 혁신 심포지엄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위한 자리다. 전 세계 혁신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혁신 사례를 경청하고, 그들의 혁신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이번 혁신 심포지엄을 계기로 ‘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라는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가혁신의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상생과 파트너십을 통한 국가 혁신 주체들의 ‘개방과 협력’이 기본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준승 <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jslee@kistep.re.kr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