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주하던 인도, 高물가ㆍ정부 부패에 발목잡혀 '휘청'
올해 성장률 8% 못넘길 듯
인도 상무부는 지난달 도매물가지수(WPI)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06% 상승했다고 14일 발표했다. 4월의 8.66%는 물론 예상치(8.74%)를 웃도는 수준이다. 인도는 소비자물가 대신 도매물가를 물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올해 인도의 물가안정 목표치는 6% 수준이다.
인플레 가속화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다. 인도중앙은행(RBI)은 16일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망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2010년 3월 이후 열 번째 금리 인상이 된다. 사미란 차크라보르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정책결정자들은 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잇단 금리 인상에도 물가 잡기가 여의치 않다는 데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곡물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엔 휘발유 가격을 8.5% 올렸다. 2008년 6월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정유회사의 손실을 줄이고 정부의 휘발유 보조금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는 국제유가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려고 9%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줄어드는 외국인 투자도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외자 유치 감소는 관료주의로 의한 지나친 규제 탓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23억달러였던 인도의 외자 유치는 2008년 33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2010년에는 259억달러로 떨어졌다. 올 들어 3월까지 외자 유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34억달러에 그쳤다. WSJ는 "인도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는 했지만 관료들의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 선정 비리,영국 연방경기대회 비리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도력을 잃은 것도 성장의 걸림돌로 꼽힌다. 최근 만모한 싱 총리는 "아시아 3대 경제대국이 되려면 부패를 척결하고 국정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투자가 움츠러들 수 있다"고 전했다.
수비르 고칸 RBI 부총재는 "인도 경제가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은 8% 선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도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7.8%로 2009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8% 이하로 떨어졌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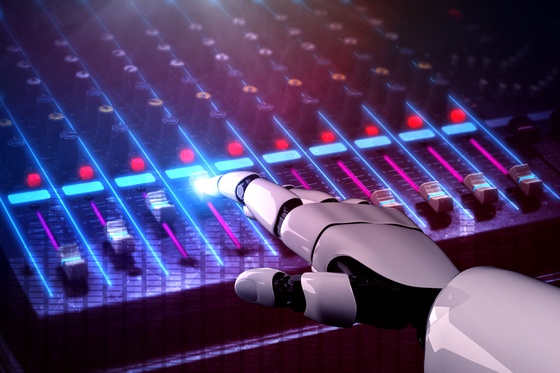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