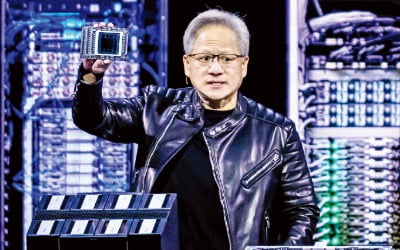[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방통위가 문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방통분야 규제당국의 최고 수장이라는 사람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소비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사업자는 차라리 정부가 통신사업을 하라고 말한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에 퇴짜를 놓았다. 또 다시 "정치논리냐"고 하지만 정치인들을 탓할 것도 없다. 그들이 선거를 의식해 통신요금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은 15대 총선이 있었던 1996년부터 시작해 매번 그랬다.
정치인들이 끼어들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은 방통위다. 통신요금이 정치적 소재가 되는 것은 시장경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이고,이는 곧 방통위의 경쟁정책 실패를 의미한다. 요금체계를 아무리 사후적으로 손질해본들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일 뿐이다. 시장구조 변화,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인하가 정답이지만 정작 방통위의 정책적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사업자 수를 늘린다면서도 제4 이동통신사는 겉돌고 있다.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라도 빨리 도입했어야 했지만 다른 나라가 하는 일을 우리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요금인하와 사업자의 투자여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요금논쟁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지만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얘기다. 누가 방통위에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몰라도 방통위는 균형점을 찾아낼 능력이 없다. 설사 방통위가 균형점을 제시한들 소비자,사업자 모두 수긍할 리도,만족할 리도 없다. 그래서 규제당국에 의한 직접적 요금규제는 소비자정책에서도,산업정책에서도 그 실효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다. 결국 방통위가 자신의 정체성을 헷갈리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기본적 스탠스가 소비자 후생 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나, 또 그것을 요금규제가 아닌 경쟁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신념 같은 것이 없는 것은 그 당연한 결과다.
물론 망 투자는 중요하다. 스마트 시대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망 투자도 직접적 요금규제가 아닌 투자유인책으로 풀어야 한다. 게다가 지금의 망 투자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그런 식으로 요금을 내릴 양이면 정부가 망 투자를 하라"고 했다지만 그 배경에는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당장 스마트TV가 걱정이라고 했다.
지금 미국 유럽할 것 없이 데이터 폭증으로 인한 트래픽 관리와 함께 망투자, 망사용 대가 배분 등을 놓고 이른바 '망 중립성' 논쟁이 한창이다. 여기에는 통신사업자,인터넷사업자,방송사,제조사,소비자 등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이는 국경을 넘는 이슈이기도 하다. 규제당국의 스마트한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의 방통위는 전혀 스마트하지 않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안현실 논설위원 /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