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급한 위성재난통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렇다면 이번 같은 대재앙에도 사용 가능한 통신망은 없을까. 현재 기술로는 위성통신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인공위성은 지상과 무관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동안 위성은 지상과 통신을 하려면 단말기의 크기가 매우 커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위성 안테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크기의 작은 단말기로도 지상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위성과 통신할 수 있게 됐다.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는 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에 알릴 수 있으므로 개인이 재난에 처했을 때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2009년 7월에 발사돼 현재 운용 중인 미국의 위성 테레스타(Terrestar)와 작년 11월에 발사된 스카이테라(Skyterra)는 각각 안테나 크기(지름)가 18m와 22m이다. 이제까지 가장 큰 위성안테나가 수m인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이 정도 크기의 안테나가 부착된 위성이면 현재 휴대폰에 위성칩만 장착해 바로 위성과 통신이 가능하다. 비상시에는 버튼 하나로 위성을 통해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일본도 기술시험위성이라는 이름으로 19m짜리 안테나를 탑재한 위성을 2006년 12월에 발사한 바 있다. 이 위성을 이용해 지상에서의 개인휴대통신을 실험해 왔는데,만약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의지가 조금만 더 있었다면 이번 대재앙 이전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가깝게는 산불,태풍부터 멀게는 지진 및 백두산 화산폭발 등 대규모 자연재앙에 대비해야 한다. 연평도,천안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쟁에 의한 재난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에서도 국가재난통신망을 포함한 통합재난안전망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통신대국이라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 지상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어 재난통신시스템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위성을 활용한 개인재난휴대통신서비스에 관해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문제는 시급성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강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우선 작년에 발사한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을 이용해 1단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궁극적으로는 지상통신망과 위성통신망을 아우르는 통합재난통신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김재명 < 인하대 정보통신공학 교수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기고] 글로벌 경영의 필수품 'ESG 전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62998.3.jpg)
![[한경에세이] 떠오르는 인도, 동방의 등불 코리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29524.3.jpg)
![[주용석 칼럼] 연금개혁, 정부안부터 내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4477123.3.jpg)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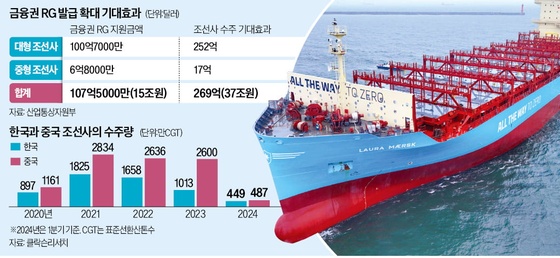





!["강남 사모님도 매번 예약 실패"…'아트 갤러리 투어' 뭐길래 [현장+]](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3557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