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는 北으로, 김정일은 中으로' 美입장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사적이고 인도적 방문'이라며 대북관여(engagement) 정책으로의 해석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탈(脫) 천안함-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방한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피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격 방중에 대해서도 짐짓 공식 반응을 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했다.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기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한 논평요청에 "내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북한당국에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한.미 당국의 정보라인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시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지만, 상당기간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예의주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날 경우, 그의 의중을 파악하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 행정부가 카터 전 대통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 '카터 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인 만큼 카터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면담 성사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카터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 일'이라며, 억류 중인 아이잘론 말론 곰즈씨의 귀환만 무사히 이뤄진다면 'OK'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과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최근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천안함 사건 이후의 대북제재 국면을 불편해하면서, 여기서 서둘러 벗어나야겠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16∼18일 방북했던 중국 우다웨이 대표는 `예비회담' 개최를 골자로 한 6자회담 3단계 재개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국면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이런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국무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크롤리 차관보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밝힌대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 회동이 생산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북한의 행동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백악관이나 국무부는 6자회담 재개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일치된 해석이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가시적인 행동 등을 거쳐 한국이 `대화모드로 바꾸는 것에 적절한 여건이 성숙했다'라고 판단할 때, 한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미국도 함께 움직인다는 입장이라는 것.
다만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반성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며, 한미 양국이 상황 전개를 봐가며 협의를 통해 탄력성을 발휘한다는데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소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틈은 열어놓은 채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지켜본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셈이다.
크롤리 차관보가 이날 우다웨이 대표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북한의 선(先)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제안 자체를 일축하지는 않았고, 내달 유엔총회 기간 당사국간 대화 모색을 언급한데서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sgh@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뉴욕증시 또 사상 최고…AI 베일 벗은 애플은 1.91% 하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10626079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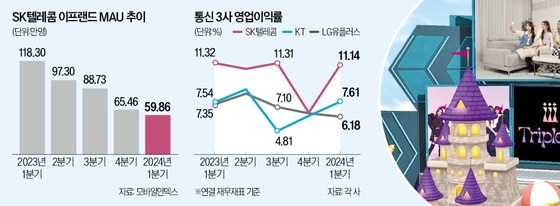





![[신간] 정부·법보다 강력해진 거대 기술기업…'플랫폼 공화국'](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700008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