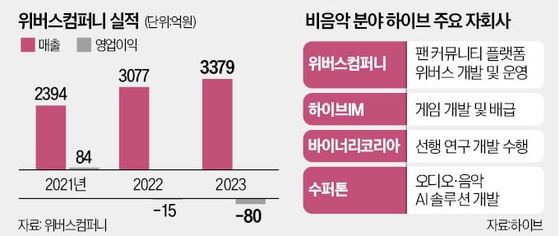우리금융 매각주관사 선정 놓고 '신경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쟁사 "매각 대상이 주관사 안돼"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3일까지 국내외 증권사와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매각 주관사 입찰제안서를 받는다. 주관사 선정은 추석 연휴 이전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사 두 곳,외국사 한 곳이 공동 주관사를 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우리금융지주 지분 블록세일 때 주관사를 맡아온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경쟁사들은 '이해상충' 문제를 들어 우리투자증권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매각 주관사는 매각주체인 예금보험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투자증권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리금융 지분매각은 결국 우리투자증권의 모회사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관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한다. 해외에서도 금융회사를 매각할 때 자회사나 관계회사들이 주관사를 맡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1997년 이후 증권사를 보유한 금융회사 매각 딜 15개 중 14개가 자회사 또는 관계사가 매각 주관사를 맡았다. 2007년 ABN암로홀딩스를 RFS홀딩스에 매각할 때도 자회사인 ABN암로증권이 주관사를 담당했다. 매각 주관사의 모회사가 될 회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딜 구조가 우리금융 매각과 거의 비슷하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가 매각 주관사를 맡을 경우 오히려 우리금융그룹의 정보가 경쟁사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우리투자증권이 우리금융 매각을 원치 않을 경우 문제 소지가 있긴 하지만 정부가 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단독] 새마을금고 '초비상'…124곳에 '부실 딱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0132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