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구전략에 도전으로 다가온 미국의 경기둔화
이 같은 상황변화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2.0%에서 2.25%로 올리면서 출구전략에 시동을 건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임에 틀림없다. 이에따라 오늘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그 어느때보다 주목을 끌고 있다.
회복세에 들어섰던 미국 경제가 다시 둔화되고 있는 것은 고용이 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난 7월 일자리가 13만1000개나 줄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이는 가계 소비를 줄이고 기업의 매출과 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일본도 지난 1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제로 수준의 정책금리(연0.1%)를 20개월째 동결했다.
우리 경제 상황은 선진국과 다른 만큼 미 · 일 중앙은행의 결정이 금통위 회의에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굼뜬 회복과 달리 우리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물가마저 들썩이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전체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만3000명 늘어나는등 고용 회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만 기준 금리를 올릴 경우 미국과의 금리 차이(2%포인트)가 더 벌어져 원화 가치를 밀어올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높은 게 현실이다. 금통위는 이 같은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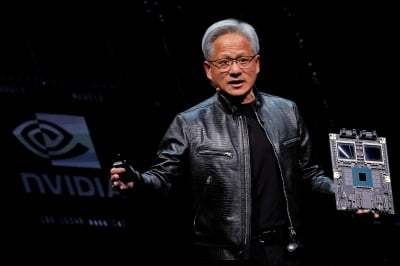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