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현실적 부가가치 계산은 기업단위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본은 더 복잡한 개념이지만 내구성 생산 도구를 뜻하는 실물자본만 나타내는 뜻으로도 쓰인다. 노동,자본,그리고 생산활동의 공간이 되는 토지(land)를 합하여 '생산의 3대 요소'라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흔히 토지까지 자본에 포함시켜 자본이라고 부른다.
자원 채취에서 최종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의 전 과정은 이어지는 수많은 중간단계의 연결체이면서,서로 다른 수많은 과정들이 서로 얽히고 흩어지는 복합체다. 예컨대 목재와 황산은 펄프생산의 원료이지만 종이는 다른 많은 생산활동에 쓰인다. 각 단계의 생산은 그 전 단계의 생산물들을 중간재(intermediate goods)로 넘겨받아서 작업을 수행한다. 노동은 각 단계에서 자본을 도구로 쓰면서 중간재를 가공하는 것이다. 각 단계 생산물의 가치와 사용된 중간재 가치의 차이를 그 단계가 생산한 부가가치(value added)라고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단위는 보통 기업이다. 기업은 출자한 자금으로 생산설비를 갖춘 다음 고용한 노동자들을 생산활동에 투입한다. 이어지는 단계의 생산을 서로 다른 기업들이 담당한다면 중간재는 값을 지불하는 거래를 통해 넘겨진다. 아직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는 생산물의 가치도 이 값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만약 같은 기업이 연속된 몇 개의 중간 단계의 생산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중간재는 매매과정 없이 그냥 넘겨진다. 이 경우에는 중간재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므로 해당 단계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부가가치는 기업단위로 계산된다. 한 기업이 일정 기간에 생산하여 판매한 생산물 가치와 다른 기업들에서 매입한 중간재 가치의 차이가 그 기업이 그 기간에 생산한 부가가치인 것이다. 설비를 갖추고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이 100억원어치의 원자재와 부품을 구입해 여러 가지 제품을 500억원어치 생산했다면 이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400억원이다.
각 단계의 생산과정에서는 중간재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설비 등 도구의 마모,즉 감가상각도 발생한다. 부가가치의 계산에서 자본의 감가상각은 빼지 않으므로 그 값은 조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이다. 단계별 생산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부가가치로는 자본의 감가상각을 뺀 순부가가치(net value added)가 타당하지만,감가상각은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조부가가치를 사용한다.
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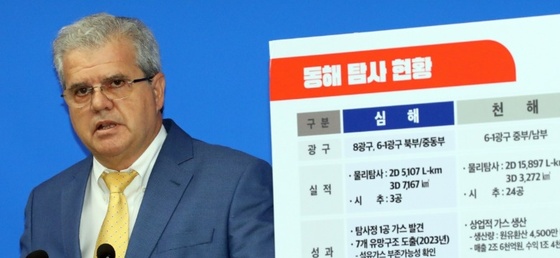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반나절 만에 3,200억 원 손실…시장 흔든 트레이더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8064644263.jpg)








![[고침] 문화([신간] 병자호란과 삼전도 항복의 후유증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686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