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조 NH증권 전무,박영춘 SK전무,문홍성 두산 전무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행정고시 29~31회 경제관료들의 민간 '엑소더스'를 지켜본 금융위 고위 간부의 입에서 나온 장탄식이다.
이직 당시 박영춘 전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을 거쳐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금융팀장을 맡고 있었다. 문 전무도 국제금융 분야의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 들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공기업 개혁을 담당했다. 후배들은 "역할 모델로 삼을 선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한 간부는 "최소한 차관은 할 만한 선배들인데…"라며 아쉬워했다.
엘리트 관료들이 전성기인 40대 중반에 과감히 공직을 박차고 민간에서 새 둥지를 튼 이유는 무엇일까. 박 전무는 "공직사회의 근무여건이 나빴다기보다는 민간 사이드의 흡입력이 컸다"고 말했다. 1994년 당시 상공자원부 과장직을 버리고 SK로 자리를 옮긴 정만원 SK텔레콤 사장이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권력 이동'을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 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최경환(행시 22회) 지식경제부 장관은 "과거 개발연대에는 경제 권력의 50%가 과천(정부)에 있었다면 지금은 90%가 시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현승 SK증권 사장(행시 32회)은 "최근 우리 경제에는 각 부문과 영역 간 융 · 복합,탈영역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며 "고위 공무원의 민간이직 현상도 이러한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공직 사회의 내부요인이나 민간의 흡인력 차원을 넘어 민 · 관의 융 · 복합과 탈영역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도 "경제부처 엘리트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으면서 쌓은 매크로(macro · 거시적인)한 기획력과 정책 이슈에 대한 판단능력,글로벌한 시각은 민간 출신 인사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고위 공직자=고위직 임원으로 장수(長壽)'라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장일형 한화 부사장(행시 14회)은 "민간은 공직에 비해 리스크가 훨씬 높다"며 "자기 나이에 비해 직급을 더 받는 경향이 있지만 순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미 민간에도 유능한 인재가 많이 포진돼 있고 다이내믹한 조직문화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이 없으면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팽(烹)'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직급이 높으면 성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박 전무가 에둘러 말했지만 '민간의 흡입력'에는 공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효율적인 보상 시스템도 포함돼 있다. 민간으로 이직한 대부분의 관료들이 그들의 선택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한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다.
22년 넘게 공직에 있다가 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스카우트된 전직 고위 관료는 스스로를 '생계형' 전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있을 동안 단 한 시간도 업무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자신을 위해 희생한 가족과 파산 직전의 가계가 눈에 밟혔다"고 털어놨다. 또 "공직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장"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핵심부서 과장도 "지금도 차관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그전에 과로사하거나 이혼당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지만…"이라며 씁쓸해 했다.
금융위의 한 간부도 "경제부처 장관이 증권사 부장 정도의 급여를 받는 희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앙정부를 지주회사로,각 부처를 계열사로 보면 민간처럼 업무 성과와 강도에 보상 시스템을 달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부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창 유진증권 회장(61 · 행시 14회)은 "지금의 공직은 적은 봉급으로 소명의식까지 갖춰야 하는 성직과도 같다"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기대와 책임을 물으면서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공직에 몸담을 생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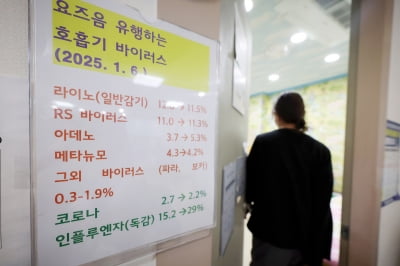
![[단독] "5년치 일감 쌓여"…미국서 '돈벼락' 맞은 한국 기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0957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