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쏟아 부었지만 출산 2년째 내리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계청은 24일 지난해 출생아 수가 44만5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2만1000명(4.4%)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5년 43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30년 전인 1981년(81만7400명)에 비해선 반토막 수준이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도 1.15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뒤 2006년 1.12명,2007년 1.25명으로 증가하다 2008년(1.19명)과 지난해 다시 떨어졌다. 김동회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한국의 출산율은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계속되는 만혼(晩婚) 추세와 경기침체로 결혼이 줄어든 게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1세로 10년째 높아지는 추세다.
출산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1명대로 떨어지자 2005년 '저출산 5개년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조7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도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둘째아이 이상으로 확대하고 불임부부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등 총 5조9600억원을 배정했다. 5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에 들인 돈만 무려 19조7400억원에 달한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미래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취학연령을 1세 낮추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2차 저출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저출산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대책을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뉴욕증시-주간전망] 연준, 물가 보고서와 애플](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7517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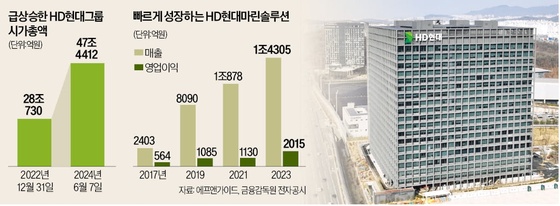


![[단독] 안경업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추진' 집단소송](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97799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