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칼럼] 日 관료개혁과 매미論
매미론에는 일본 관료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집단이라는 인식과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녹아 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그들의 노력과 봉사에 크게 힘입은 덕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런 일본 관료들이 지금 천덕꾸러기 신세다. 지탄의 대상,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온갖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관료와의 전쟁'을 전면에 내세워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사실이 보여주듯 정권도 국민도 등을 돌렸다. 하토야마는 국회 연설에서도 "행정을 대청소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平成(헤이세이 · 일본의 연호) 유신'으로 이름 붙였다.
그가 '전쟁'이니 '유신'이니 하는 과격한 단어까지 사용하며 개혁에 나선 것은 관료중심체제가 길어지면서 관료들이 전횡을 일삼아왔다고 보는 탓이다. 사무차관회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건을 사실상 통제하며 국정을 주무른 것은 물론 주요 단체나 기업에 퇴직 공무원을 무더기로 내보내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경제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그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4500개 단체에 2만5000명의 퇴직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됐고 그들이 사용하는 세금만 12조엔에 달한다"는 게 하토야마의 지적이다.
관료사회 개혁론은 사실 뿌리가 깊다. 일본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장기불황으로 접어들면서 줄곧 제기돼온 문제다. <평성 유신> <평성 관료론> 등의 저서를 통해 '평성 유신'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경영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는 "일본은 관료독재국가"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만연한 낙하산 인사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턱없이 과도한 대우를 지적하면서 "관료는 더 이상 매미가 아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나비'가 되고 어떤 이는 '잠자리'로 변신해 계속 영화를 누린다. 그들은 '불사조'"라며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다.
하토야마 총리가 국가전략국과 행정쇄신회의를 신설해 국정 전반에 근본적 수술을 가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불사조를 다시 성실한 매미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작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관료사회의 조직적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서다.
하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리 공직 사회 또한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웬만한 공기업 경영자 자리는 퇴직 관료들이 꿰차고 있고 금융감독원 등 비정부기관까지 낙하산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권한남용과 부정부패는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 산하 기업을 윽박지르고 공금을 쌈짓돈처럼 여기는 비리 사례들은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관료사회 개혁에 비장한 각오로 임하는 것 같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나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강조했고 이재오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한 "내년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 순위를 공개하겠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사회가 긴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단시일 내에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도 드물다.
관료사회에 비리가 만연한 상태론 나라가 바로 서기 어렵다.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공직자들의 매미 정신을 되살리는 일은 우리가 더욱 절실하다.
수석논설위원 bk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다산칼럼] 금융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7877087.3.jpg)
![[취재수첩] 美암학회에 초대받지 못한 韓 AI 신약 벤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955477.3.jpg)
![[차장 칼럼] 포기하기 전에 가볼만한 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27259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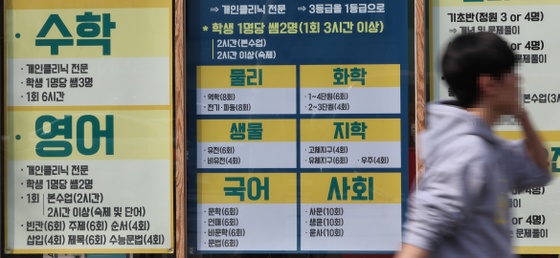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엔비디아 첫 시총 3조 달러…애플 5개월 만에 3위로 추락 [글로벌마켓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31607295542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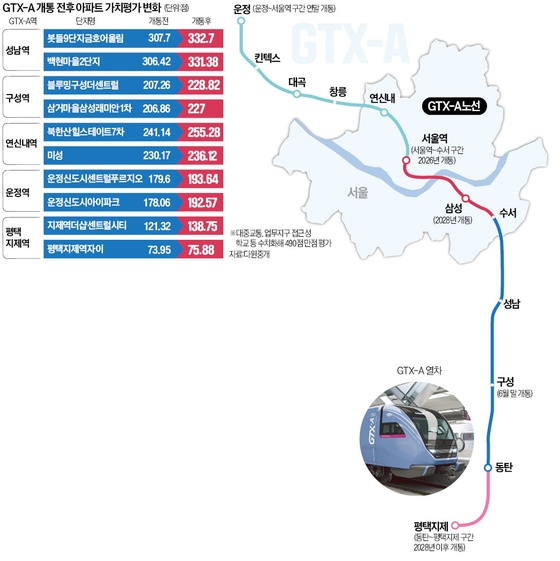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이 아침의 발레리노] 중력을 거스른 몸짓…발레를 해방시키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531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