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재설정 기로에 선 친이-친박
지난 2007년 대통령후보 경선 때 비롯된 양 계파간 갈등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과거의 이전투구식 갈등은 보이지 않지만 시한폭탄을 안은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양 진영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신경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당내 주류인 친이측이 참패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 단합 카드로 `김무성 원내대표론'을 꺼내들었으나 박근혜 전 대표가 `원칙'을 내세워 반대의사를 되풀이하면서 양측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제시된 해법이 오히려 양측의 불화를 표면화한 촉매제로 작용한 셈이다.
친이.친박의 갈등이 앞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한나라당의 `불치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 서열 2위의 자리를 친박 진영에 맡기겠다는 친이측의 `성의'를 친박측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단지 박 전 대표가 주장하는 `당헌.당규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 진영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정권 출범 이후 두 사람은 두차례의 단독 회동을 가졌지만 화해의 기류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회동 이후 `당 대표 제안설'(2008년 5월), `회동 사실 언론 유출설'(2009년 1월) 등의 논란만 낳았다.
양측의 진정성 문제가 불거진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근본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의 화합책은 무의미하다", "김무성 원내대표론으로 친박 분열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친박측의 주장 및 의구심과 맥이 닿아있다.
나아가 양 진영의 갈등이 단순히 감정싸움이 아니라는 점도 갈등 해소가 어려운 이유중 하나다.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력투쟁이 잠복해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특히 공천권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류인 친이측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반면 지난해 총선 당시 `보복 공천'을 당했다고 보는 친박측은 더이상의 `보복'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당장 오는 10월 4.29 재보선 보다 큰 규모의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공천권을 둘러싼 양측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10일 "친박 입장에서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이게 불화의 핵심 아니냐"고 말했다.
양 진영간 정책 및 국회 문제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주도하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자리를 맡긴다 해도 근원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친박쪽 입장이다.
동시에 당내 `뜨거운 감자'인 당협위원장 문제를 비롯해 쇄신특위의 쇄신안 성안 등도 양측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친이계 핵심 의원은 "궁극적으로 친박측이 요구하는 화해의 방법은 `차기를 보장하라'는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다만 박희태 대표와 친이측이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이고, 친박내에 "너무 매몰차게 거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양 진영이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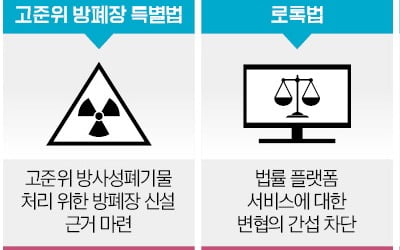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