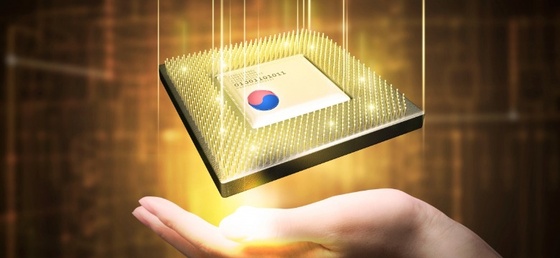가자 생존자들 "아비규환…피할 곳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신을 차리니 주위에는 피투성이로 잘려나간 동료들의 시신과 건물 잔해가 나뒹굴고..그 방에서 살아남은 것은 나 하나다"
가자 지구의 경찰서 직원인 함마드 카말하산 아부 라반(24)씨는 8일 암만의 퀸알리야 육군병원에서 연합뉴스 기자에게 폭격 상황을 설명하다 당시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 도중에 말을 흐렸다.
요르단 정부가 지난 2일 군용기로 암만으로 이송한 라반씨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첫 가자 공습에서 다리 골절과 함께 손가락ㆍ발가락 일부가 절단되고 온몸에 파편이 박히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복부 상처가 깊어 비장도 제거해야 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한고비를 넘긴 그는 "오전 10시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출현했지만 평소처럼 정찰일 뿐이라는 상사의 말에 미처 대피를 못했다"며 "건물 안에 있던 50여명 중 생존자는 열 명도 안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인 아이마드 함두네(20)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자발리아 난민캠프 외곽의 5층 주택 건물이 폭격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엉덩이와 왼발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폭탄을 맞은 건물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려 동료와 주위를 정리 중이었는데 2분여 만에 두번째 폭탄이 떨어져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근처에 있던 주민 50여명이 죽거나 다쳤고 그 절반가량이 여성과 어린이였다"고 전했다.
라반씨와 함두네씨를 포함해 암만으로 옮겨진 가자 폭격 생존자들은 모두 8명.
이들은 대부분 척추ㆍ다리 등의 골절과 신체 일부 절단, 화상 등 중상을 입었지만 가자에서는 기본 처치 정도에 그치다 암만에 와서야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진과 약품 부족 등으로 가자의 의료 상황이 한계에 달한 데다 병원 역시 지속적으로 폭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함두네씨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복도에 꽉 차 있어 수시간 후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입원한 나흘간 병원 건물들이 두 번이나 폭탄을 맞았고 수시로 계속되는 폭격으로 건물과 침대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곤 했다"고 말했다.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한 아버지 아타하산 함두네(45)씨는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은 물론 구급차도 턱없이 모자라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해서 승용차로 부상자들과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가까스로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게 됐지만 이들은 가자에 남은 가족 걱정에 마음 놓을 틈이 없다.
아내와 각각 한 살과 두 살인 두 아들, 부모님, 10명의 형제자매를 가자에 두고 온 라반씨는 집이 부서지는 바람에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전기도 끊어지고 물ㆍ식량 등 필수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폭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가자 어디에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부상자 중 유일한 여성인 하나 맙보흐(29)씨는 첫날 공습으로 이미 한 살 아래 남동생을 잃었는데 이날 시동생 등을 포함한 일가 친척 5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인터뷰 직전에 전해진 비보에 한동안 망연자실한 듯 보였던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 땅을 지킬 것"이라며 조용히 돌아누웠다.
(암만연합뉴스) 권수현 특파원 inishmor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