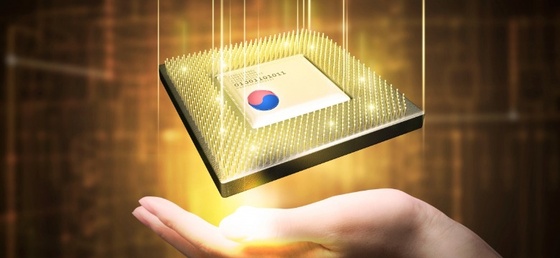오바마 행정부 구직 희망자 33만명 돌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2일 정권 이양 문제를 모니터해온 비당파적 단체인 `공익근무 연합회' 보고를 인용해 차기 행정부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며 고위직 지망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33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일 뉴욕 타임스(NYT)의 `30만명 원서 제출' 보도에 비해 3만여명이 증가한 수치이고 과거 정권 이양기에 비해 엄청나게 폭증한 셈.
조지 부시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기였던 지난 2000년말-2001년 1월에는 구직원서 제출자가 4만4천여명 그리고 빌 클린턴 당선자의 지난 92-93년 인수기때는 13만5천여명이 지원서를 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구직 열기가 이례적으로 높은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차기 행정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권 인수위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원서를 제출하면 될 정도로 원서 제출 절차가 쉽다.
여기에 경제위기에 처한 미국을 살리는데 일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구직기회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8년간 공화당 정권의 집권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연방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던 점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익근무 연합회'의 맥스 스타이어 대표는 "오바마 당선인은 정부가 경쟁력을 갖춘 능력있는 정부로 다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행정부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행정학회의 제니퍼 돈 회장도 "오바마 당선인이 새로운 그룹의 미국인들을 열광시키고, 정부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원서 제출자 중에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도 비일비재하다.
예일대 로스쿨과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레베카 보너(35.여)는 올해초까지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엄청난 승진' 제의를 받았지만 이를 뿌리치고 오바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7개월간 풀 타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현재 행정부 근무를 위해 원서를 제출한 그녀는 "월가에 근무하면서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행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고장난 미국경제와 외교를 되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원을 졸업한 마크 그린버그(25)도 대선기간에 오바마의 국가안보 자문팀에서 근무했는데 현재 국방부, 국무부 근무를 희망하며 원서를 낸 상태.
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원서를 낸 만큼 행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나 같은 레벨의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인선이 이뤄진다니 내년 봄이나 여름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연방 정부 보직은 연방정부 판사와 외교관 및 각종 위원회 직원을 제외하면 ▲부장관, 차관, 차관보 등 상원인준을 거쳐야 하는 고위직 1천여개 ▲고위공무원직 8천여개 ▲관리직 가운데 800여개 보직 ▲연봉 2만5천-15만달러의 C직렬 1천500여개 등 대략 3천-4천개에 불과하다는 점.
행정학회의 제니퍼 돈 회장은 "구직 희망자중에서 탈락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도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익근무 연합회'의 맥스 스타이어 대표도 정권인수위원회는 행정부 근무를 희망했다 탈락했던 사람들에게 주정부나 지방 정부의 일자리라도 얻을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치 않을 경우 우군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만세력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