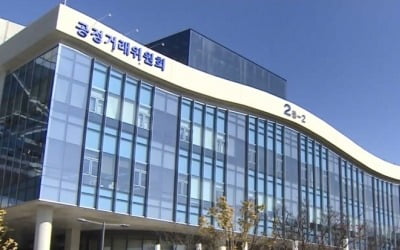[금융 히트상품] 퇴직연금의 모든 것 : 퇴직연금 도입률 아직은 5%불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시장규모가 1조8000억원,가입근로자가 40만명에 이르는 등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아직 5%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제도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세제혜택,중간정산제 폐지 등 제도개혁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정적인 확정급여형(DB) 63%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정부와 기업,사용자 및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1조8761억원으로 전년동월(4676억원) 대비 4배 정도 늘어났다.
계약건수는 2만7955건,가입 근로자는 39만9222명이다.
연금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63%,확정기여형(DC)이 27%,개인퇴직계좌(IRA) 10% 등으로 확정급여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는 형태이며,확정기여형은 기업의 부담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형태다.
확정급여형이 많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기를 선호한 결과로 해석된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자별로는 보험사가 전체 시장의 57%를 차지고 있으며 은행 34%,증권은 9%의 비중을 차지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이 노후대비를 위한 것인 만큼 기업들이 퇴직금 시장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축적해온 보험사를 선호한 결과로 보인다.
적립금이 운영되고 있는 상품을 봐도 금리형 보험상품 48%,예ㆍ적금 29% 등 77%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운영되고 있다.
◆2015년에는 144조원 시장 전망
기업들의 퇴직연금제 도입률이 저조한 것은 시행 당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2010년부터 제도도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2010년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증권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으로 완전 전환해야 하는 2010년의 시장규모는 44조원,2015년에는 14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대신 퇴직연금의 비중 및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선진국들은 근로자의 노후 복지 증대를 위해 퇴직연금의 준(準)강제화를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퇴직연금제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06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규모가 10조5400억달러로 전체 은퇴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인 1996년의 5조7180억달러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미국은 2006년 8월 도입된 연금보호법(Pention Protection Act)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
연금보호법은 공적연금의 기여도는 축소하는 대신 퇴직연금은 보편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신규 입사자가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ㆍ기업ㆍ근로자 인식전환 시급
삼성생명의 조지 베람 고문(미국 보험 정계리사)은 "한국은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도 국가 및 개인 차원의 준비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며 "경제활동 1인당 연금자산 규모는 미국의 12분의 1,일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1인당 연금자산은 918만원으로 일본 5810만원,미국 1억79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만큼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퇴직연금 제도가 지난 2년 동안 대중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중간정산제 폐지 등 규제개혁과 인지도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투자수단도 보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조지 베람 고문은 "미국이 퇴직연금 가입을 국가적으로 독려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주ㆍ근로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시장규모가 1조8000억원,가입근로자가 40만명에 이르는 등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아직 5%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제도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세제혜택,중간정산제 폐지 등 제도개혁도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정적인 확정급여형(DB) 63%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정부와 기업,사용자 및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이 1조8761억원으로 전년동월(4676억원) 대비 4배 정도 늘어났다.
계약건수는 2만7955건,가입 근로자는 39만9222명이다.
연금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63%,확정기여형(DC)이 27%,개인퇴직계좌(IRA) 10% 등으로 확정급여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는 형태이며,확정기여형은 기업의 부담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형태다.
확정급여형이 많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기를 선호한 결과로 해석된다.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업자별로는 보험사가 전체 시장의 57%를 차지고 있으며 은행 34%,증권은 9%의 비중을 차지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이 노후대비를 위한 것인 만큼 기업들이 퇴직금 시장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축적해온 보험사를 선호한 결과로 보인다.
적립금이 운영되고 있는 상품을 봐도 금리형 보험상품 48%,예ㆍ적금 29% 등 77%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운영되고 있다.
◆2015년에는 144조원 시장 전망
기업들의 퇴직연금제 도입률이 저조한 것은 시행 당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2010년부터 제도도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2010년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증권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으로 완전 전환해야 하는 2010년의 시장규모는 44조원,2015년에는 14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대신 퇴직연금의 비중 및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선진국들은 근로자의 노후 복지 증대를 위해 퇴직연금의 준(準)강제화를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퇴직연금제가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06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규모가 10조5400억달러로 전체 은퇴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인 1996년의 5조7180억달러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미국은 2006년 8월 도입된 연금보호법(Pention Protection Act)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
연금보호법은 공적연금의 기여도는 축소하는 대신 퇴직연금은 보편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신규 입사자가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ㆍ기업ㆍ근로자 인식전환 시급
삼성생명의 조지 베람 고문(미국 보험 정계리사)은 "한국은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도 국가 및 개인 차원의 준비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며 "경제활동 1인당 연금자산 규모는 미국의 12분의 1,일본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1인당 연금자산은 918만원으로 일본 5810만원,미국 1억79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만큼 노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퇴직연금 제도가 지난 2년 동안 대중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중간정산제 폐지 등 규제개혁과 인지도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투자수단도 보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조지 베람 고문은 "미국이 퇴직연금 가입을 국가적으로 독려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주ㆍ근로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세제혜택 확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