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超고유가 시대‥우리도 석유메이저 키우자] (下) 국내 현실과 과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7대 석유 소비국인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오름폭만큼 시차를 두고 경제가 충격을 떠안는 방법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형국이다.
반면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석유 메이저와 국가 간 경쟁은 갈수록 불을 뿜고 있다.
석유 메이저는 물론 준메이저급 에너지 회사들의 움직임도 부산해지고 있다.
지난 2일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일본 오키나와에 본사를 둔 난세이석유를 사들이기로 했다.
5일엔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페트로차이나(중국석유)가 세계 1위 업체인 엑슨모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면서 앞으로의 영향력을 예고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원민족주의도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고유가시대를 맞은 한국의 에너지 전략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국내에서 소비한 석유 중 국내 자본으로 생산한 물량의 비중)은 3%대에 머물러 있다.
메이저급 기업을 보유한 프랑스(98%) 스페인(60%)은 고사하고 에너지정책이 실패했다는 일본의 16.5%에도 한창 뒤처져 있다.
정부는 올초 2016년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메이저급 회사들과 샅바싸움을 벌일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따로,기업 따로'식 에너지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미국의 석유산업 정보지 PIW는 최근호에서 △석유 메이저와 비교해 열등한 기술력 △세계 100대 에너지회사를 배출하지 못한 영세한 기업 규모 등을 들어 한국의 원유 확보 전략 및 능력에 의문을 나타냈다.
◆세계는 에너지전쟁 중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던 중국은 최근 석유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올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아프리카 8개국을 순방하며 에너지 외교를 펼쳤다.
에너지 외교를 목적으로 한 후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은 올해만 3회에 달한다.
현재 중국의 자원분야 투자 규모는 메이저를 넘보는 수준이다.
프랑스 토탈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세계 곳곳의 유전 입찰에서 경제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몰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6년 나이지리아 연해 유전지대 광구의 지분 45%를 인수한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최근 22억7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2005년 카자흐스탄 석유공사(PK)를 약 42억달러에 인수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거대 석유 메이저와 '맞짱'을 뜨고 있는 셈이다.
뒷짐을 지고 있던 일본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일본 전체 우라늄 수입량의 40%에 달하는 채굴권을 확보한 게 대표적인 예다.
◆유전.가스전 개발만이 살 길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들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외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SK에너지는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매일 2만배럴의 원유를 뽑아 올리고 있다.
SK에너지는 올해 처음 브라질의 BMC 광구,예멘의 LNG 광구,페루의 LNG 광구 등에서도 생산을 시작해 2009년 말에는 현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유전 개발.생산(E&P)에 뛰어든 GS칼텍스도 지주회사인 GS홀딩스와 함께 해외 유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SK 등 국내 기업의 투자는 메이저들이 사들인 광구에 지분을 투자,수익을 배당받는 형태다.
SK에너지 관계자는 "SK의 투자 규모로는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사업인 유전 입찰에 독자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우리나라가 러시아 서캄차카 등에서 일부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세계 8대 석유 수입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석유개발 투자비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탐사정 1공의 시추 비용은 4000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광구 확보 비용 등을 감안하면 탐사광구 1개에 대한 투자비가 1억달러를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의 지난해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규모는 고작 20억9000만달러에 그친다.
이에 따라 '경량급' 수준인 유전펀드 규모를 '헤비급'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메이저정책이 메이저 만든다
자원 확보 전쟁에 나선 국가나 메이저를 보유한 선진 국가들의 상황을 볼 때 해외 자원 개발 및 확보에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저가격 정책을 시행,전력 및 가스 공급 시스템을 확충했다.
그러나 해외 자원 개발,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은 저조해 에너지 수급구조가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역할 재정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석유공사의 주요 업무인 비축과 석유개발 사업을 분리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지적이다.
석유공사 역할 재정립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 기조 자체를 민간 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에너지 이용효율 강화,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사업이 정책적인 지원 아래 민간 기업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유사의 한 고위 임원은 "전문 인력 양성,유전개발 펀드 도입 등 기업들의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총체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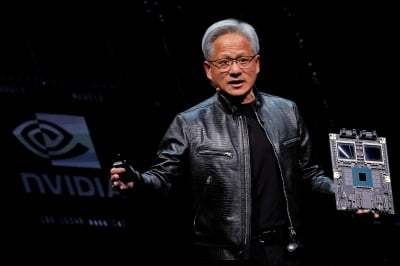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가택 연금됐던 러시아의 '反푸틴' 감독](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036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