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침에] 이라크에서의 시낭송
수천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쿠르드족이 최근에 독립의 호기를 맞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보며 나는 지난해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를 떠올렸다.
이라크의 아르빌에 있는 살라딘대학교에서 쿠르드족 시인들과 시낭송을 했던 기억이다.
그날 나는 자이툰부대의 특별 주선에 따라 살라딘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아르빌은 쿠르드족의 거주지로서 이라크의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하지만 방탄복을 준비했고 자동차에서 내릴 때는 방탄모를 착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살라딘대는 현대와 고전의 절충식 건물이었다.
카펫이 깔린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국에서 온 시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묘한 감격에 울컥 목이 메었다.
이라크와 터키,시리아에 주로 살고있다는 쿠르드족에 대한 관심을 가진지는 오래 되었지만 이렇듯 지식인들과 학생,젊은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보니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이 생생하게 감지되었다.
우리 자이툰부대가 펼치고 있는 좋은 대민활동 덕분인지 코리아에 대해 깊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문학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나는 코리아는 고유의 문자를 지닌 문화국이며 문학과 예술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한국인의 정서 속에 내재한 '한(恨)'의 긍정적 힘에 대해 역설했다.
그리고 아랍문학의 최고봉인 '아라비안나이트'와 쿠르드 출신 감독으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카메라상을 받은 바흐만 고바디 감독의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과 '거북이도 난다'를 통해 받은 뻐근한 감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전 세계에 떠도는 3000만명 쿠르드족의 슬픔을 이해하는데 그 어느 것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영어와 한국어,그리고 쿠르드족 언어로 번역되는 의사 소통의 방식 때문에 서로의 문학을 짧은 시간에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계가 있음을 느꼈지만 청중들은 진지하기만 했다.
창밖으로 벌써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청중들에게 긴급 제안을 했다.
한국시의 아름다움에 대해 긴 설명을 하는 대신 실제로 시를 낭송하고 함께 즐겨보자고 했다.
뜻밖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표했다.
나는 나의 시 가운데 끝까지 욀 수 있는 시 '찔레'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꿈결처럼/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사랑하던 그 사람/조금만 더 다가서면/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뜻밖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통역이 내용을 설명하기도 전에 벌써 가슴으로 느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쿠르드 청년 시인이 자작시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먼곳에서 당신 오시면/나 촛불 켜고 맞을 게요…/촛불은 흔들리고/말방울 소리 들리고 …/모래바람이 멈출 때까지…"
영어로 번역된 시는 대강 이런 내용이었지만 굳이 그 내용을 다 듣지 않아도 나 역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유랑의 고달픔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시낭송은 계속되었다.
한국시를 한 편 낭송하면 쿠르드 시인들이 이어서 낭송하고 이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시로 가득 채운 공간은 그야말로 따스한 정감으로 넘쳤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에서 이런 아름답고 내밀한 일이 언어를 훌쩍 넘어 일어난 것이었다. 시는 언어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것이요,가장 정제된 보석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불필요한 많은 언어보다 단숨에 가슴과 가슴을 열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지닌 것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시낭송과 시인들을 선연히 기억하고 있다.
이라크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전쟁을 떠올리고 이어서 미국을 향한 끝없는 자살 폭탄의 장면이나 콧수염이 까만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모습을 얼른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라크는 찬란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일찍이 눈부신 문화의 꽃을 피운 지역이다. 더위가 가고 지상에 가을이 오고 있다. 세상에 아니,사람들의 가슴에 촛불처럼 시의 불을 켤 시간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26조원과 5만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86123.3.jpg)
![[데스크 칼럼] 부천 시민들이 부러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0116591.3.jpg)
![[다산칼럼] 바보야, 이번에도 문제는 경제였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226013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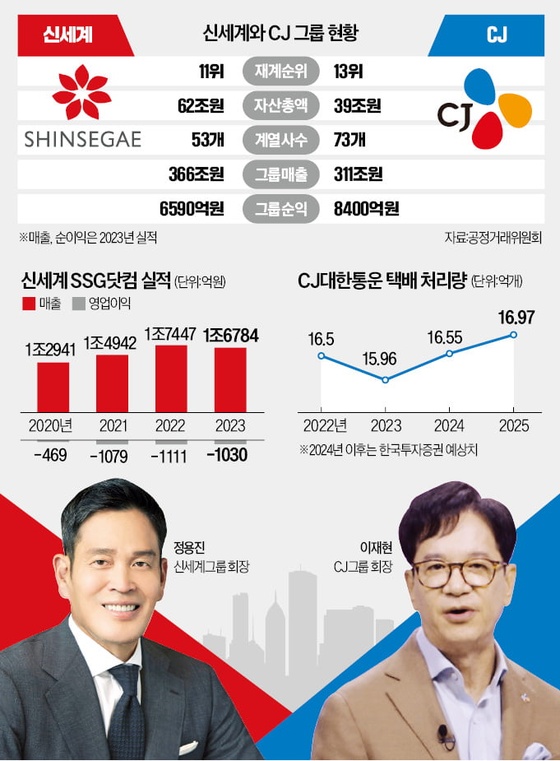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서울시향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4448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