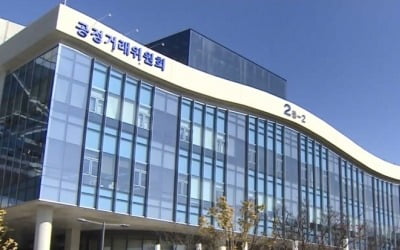정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제한 허용‥학계 "효과 의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바이오(BT)산업 육성'이란 현실론과 '생명윤리 존중'이란 당위론 사이에서 고심해오던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23일 결국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던 국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관련 연구의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2007년 줄기세포 연구 시행계획'을 발표,줄기세포 연구에만 올해 총 342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학계와 산업계는 국가생명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본인의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쓰고 남은 난자'로 규정하고 있어,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기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세포 복제 연구 주도권 상실 위기감 작용
생명윤리계와 과학계·산업계는 그동안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여부와 관련,'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국가생명위의 이날 결정은 과학계와 산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근 1년여 동안 한국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중단된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는 한편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어 한국도 하루빨리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재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미 하버드대 연구팀은 체세포 핵 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복제 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호주 상원은 지난해 말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인간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역시 인간 배아복제에 관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계·산업계 '사실상 불허' 냉담
배아줄기세포는 크게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로 나뉜다.
이 중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는 여성의 난자를 별도로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윤리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황 박사 사건 이후 국내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연구건수는 지난해 총 41건으로 2005년(34건)에 비해 오히려 늘었지만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사실상 중단됐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생명윤리법 시행령이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재개될 법적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과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장은 "황우석 박사가 건강한 난자를 2000개 쓰고도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는데 죽어가는 난자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형민 차바이오텍 대표도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난자를 구하는 방법에 제한을 둘 뿐 난자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자 입장에서는 국가생명위의 이번 결정을 '연구 허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던 국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관련 연구의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2007년 줄기세포 연구 시행계획'을 발표,줄기세포 연구에만 올해 총 342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학계와 산업계는 국가생명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본인의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쓰고 남은 난자'로 규정하고 있어,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기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세포 복제 연구 주도권 상실 위기감 작용
생명윤리계와 과학계·산업계는 그동안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여부와 관련,'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국가생명위의 이날 결정은 과학계와 산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근 1년여 동안 한국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중단된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는 한편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어 한국도 하루빨리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재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미 하버드대 연구팀은 체세포 핵 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복제 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호주 상원은 지난해 말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인간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역시 인간 배아복제에 관한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계·산업계 '사실상 불허' 냉담
배아줄기세포는 크게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로 나뉜다.
이 중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는 여성의 난자를 별도로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윤리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황 박사 사건 이후 국내 수정란 배아줄기세포 연구건수는 지난해 총 41건으로 2005년(34건)에 비해 오히려 늘었지만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사실상 중단됐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생명윤리법 시행령이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재개될 법적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과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장은 "황우석 박사가 건강한 난자를 2000개 쓰고도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는데 죽어가는 난자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형민 차바이오텍 대표도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난자를 구하는 방법에 제한을 둘 뿐 난자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자 입장에서는 국가생명위의 이번 결정을 '연구 허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