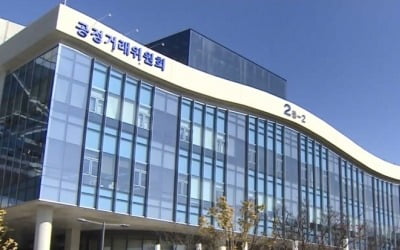풀리지 않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검찰이 못밝혔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3월 시작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사건 수사가 9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하지만 론스타의 금품 로비나 정부 고위층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은 여전히 베일에 감춰진 상태다.
게다가 검찰이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조차 구속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시의 경제 상황이나 외환은행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사후잣대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은 론스타와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요약된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당시 외환은행 등의 상황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은행법상 예외조항까지 적용해가며 무리하게 매각할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동문의 청탁과 자신이 만들 펀드에 대한 꿈 때문에" 변 전 국장이 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당시 시나리오다.
실제 변 전 국장이 설립한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이 사후에 400억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정황 증거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재산정한 결과를 제시했다.
외환은행의 적정BIS 비율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손실을 과대하게 부풀려 조작한 6.16%가 아니라 증자 실패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8~9%대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한마디로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경부 등 정부와 금융계의 시각은 180도 다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시는 외환은행은 물론 외환카드까지 부실화돼 금융시장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외환은행 조기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변양호 전 국장도 외환은행 매각을 "27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잘 한 일"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상반된 견해는 향후 법정공방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검찰에 썩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중수부 1,2과 100여명 검사와 수사관을 총동원,론스타와 변 전 국장의 공모혐의를 뒤졌지만 이렇다할 물증 확보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오히려 변 전 국장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단 하나의 외압이나 청탁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일일이 해명했다.
일개 재경부 국장이 거대 국책은행을 주도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고 당시 정책결정 라인에 있었던 진념·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이른바 '이헌재 사단'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계좌 추적 작업을 벌였지만 책임을 물을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결국 의혹의 몸통을 캐기는커녕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박영수 중수부장은 "수사대상이 외국투자회사,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이고 특히 정책결정이나 자금집행에 관여한 중요 인물과 결정적 자료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는 관계로 수사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로 수사 한계를 토로했다.
하지만 오히려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잡았다는 반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하지만 론스타의 금품 로비나 정부 고위층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은 여전히 베일에 감춰진 상태다.
게다가 검찰이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조차 구속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당시의 경제 상황이나 외환은행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사후잣대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7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은 론스타와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요약된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당시 외환은행 등의 상황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은행법상 예외조항까지 적용해가며 무리하게 매각할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동문의 청탁과 자신이 만들 펀드에 대한 꿈 때문에" 변 전 국장이 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당시 시나리오다.
실제 변 전 국장이 설립한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이 사후에 400억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정황 증거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재산정한 결과를 제시했다.
외환은행의 적정BIS 비율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손실을 과대하게 부풀려 조작한 6.16%가 아니라 증자 실패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8~9%대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한마디로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경부 등 정부와 금융계의 시각은 180도 다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시는 외환은행은 물론 외환카드까지 부실화돼 금융시장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외환은행 조기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변양호 전 국장도 외환은행 매각을 "27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잘 한 일"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측의 이 같은 상반된 견해는 향후 법정공방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검찰에 썩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중수부 1,2과 100여명 검사와 수사관을 총동원,론스타와 변 전 국장의 공모혐의를 뒤졌지만 이렇다할 물증 확보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오히려 변 전 국장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단 하나의 외압이나 청탁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일일이 해명했다.
일개 재경부 국장이 거대 국책은행을 주도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고 당시 정책결정 라인에 있었던 진념·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이른바 '이헌재 사단'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계좌 추적 작업을 벌였지만 책임을 물을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결국 의혹의 몸통을 캐기는커녕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박영수 중수부장은 "수사대상이 외국투자회사,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이고 특히 정책결정이나 자금집행에 관여한 중요 인물과 결정적 자료들이 대부분 외국에 있는 관계로 수사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로 수사 한계를 토로했다.
하지만 오히려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잡았다는 반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