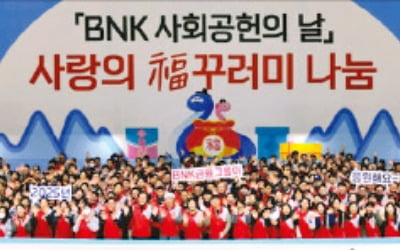[디자인도 초일류 시대] (4) <끝> 디자인 일등기업 뱅앤올룹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프리미엄 전자제품만 만드는 덴마크 뱅앤올룹슨(B&O)은 디자인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첫 번째로 꼽힐 만한 기업이다. 대중적 명품으로 소비자를 사로잡는 '매스티지(Masstige)' 전략을 펼치는 기업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이 회사 제품 중에는 20년 넘게 팔린 TV와 스피커,10년 이상 장수하는 CD플레이어도 있다. 일부 오디오 제품은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전시돼 있을 정도다.
특이한 점은 이 회사 내부에는 전속 디자이너가 없다는 사실이다. 데이비드 루이스와 같은 스타급 디자이너도 뱅앤올룹슨 사원이 아니라 계약직 디자이너다. 이처럼 디자이너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경영진의 압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창조적 정신(creativ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나머지 인력은 오로지 디자이너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이래서 나온다.
뱅앤올룹슨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작곡가 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기술진과 경영진은 연구와 실험을 수없이 되풀이해 상품화할 수 있게 보조한다. 경영진은 아이디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디자인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일단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개발자,엔지니어,마케팅 담당자 등은 지휘자인 디자이너의 손끝을 따라 조화롭게 움직인다.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며 한 시대를 주름잡는 '아이콘 디자인'은 이처럼 디자이너를 존중하고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환경이라야 나올 수 있다. 뱅앤올룹슨 방식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경영진의 마인드와 시스템이야말로 이 회사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뱅앤올룹슨의 톨번 소렌슨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제품은 한 번 나오면 보통 10~15년간 시장에서 팔릴 정도로 수명이 길다"며 "이 같은 장수 비결은 1mm의 두께도 협상하지 않는 디자이너의 고집을 존중하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디자인 인력 규모나 개개인의 역량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디자인 전문업체는 2000개가 넘고 디자인 전공자는 해마다 3만6000명이 쏟아져 나온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해외로 진출한다. 노키아 모토로라 등 내로라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는 한국 출신 디자이너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렵다. 인력 잠재력은 풍부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내엔 디자이너를 키우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는 사내에 디자인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상품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대기업은 디자인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마인드가 달린다. 디자인이 의사결정 과정의 곳곳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다.
정우형 다담디자인 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은 디자인 투자 자체를 꺼리고 대기업은 디자인 전문업체를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체'쯤으로 인식한다"며 "디자이너는 자료 리서치부터 시스템 제작까지,제품 개발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디자인하는 '프로듀서'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
특이한 점은 이 회사 내부에는 전속 디자이너가 없다는 사실이다. 데이비드 루이스와 같은 스타급 디자이너도 뱅앤올룹슨 사원이 아니라 계약직 디자이너다. 이처럼 디자이너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경영진의 압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창조적 정신(creativ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나머지 인력은 오로지 디자이너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도 이래서 나온다.
뱅앤올룹슨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작곡가 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기술진과 경영진은 연구와 실험을 수없이 되풀이해 상품화할 수 있게 보조한다. 경영진은 아이디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디자인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일단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개발자,엔지니어,마케팅 담당자 등은 지휘자인 디자이너의 손끝을 따라 조화롭게 움직인다.
소비자의 사랑을 받으며 한 시대를 주름잡는 '아이콘 디자인'은 이처럼 디자이너를 존중하고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환경이라야 나올 수 있다. 뱅앤올룹슨 방식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디자이너를 지원하는 경영진의 마인드와 시스템이야말로 이 회사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뱅앤올룹슨의 톨번 소렌슨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제품은 한 번 나오면 보통 10~15년간 시장에서 팔릴 정도로 수명이 길다"며 "이 같은 장수 비결은 1mm의 두께도 협상하지 않는 디자이너의 고집을 존중하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디자인 인력 규모나 개개인의 역량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디자인 전문업체는 2000개가 넘고 디자인 전공자는 해마다 3만6000명이 쏟아져 나온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해외로 진출한다. 노키아 모토로라 등 내로라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는 한국 출신 디자이너가 없는 곳을 찾기 어렵다. 인력 잠재력은 풍부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내엔 디자이너를 키우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는 사내에 디자인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상품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대기업은 디자인 인프라는 갖추고 있지만 마인드가 달린다. 디자인이 의사결정 과정의 곳곳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다.
정우형 다담디자인 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은 디자인 투자 자체를 꺼리고 대기업은 디자인 전문업체를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체'쯤으로 인식한다"며 "디자이너는 자료 리서치부터 시스템 제작까지,제품 개발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디자인하는 '프로듀서'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