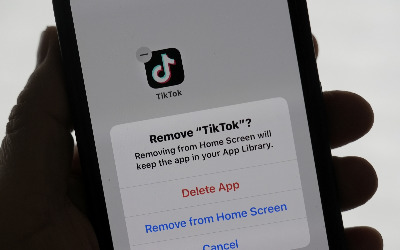[검은 新시장 아프리카] (5) 비즈니스외교 아직도 사각지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too late & slow."
한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한 아프리카 현지 기업인들의 평가다.
튀니지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수단과 앙골라 등지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바셈 루킬 푸노(FONO)사 사장은 "중국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거의 30년 동안 공을 들였다"며 "프랑스와 미국,영국도 잠재적 시장가치가 크거나 원유생산국인 곳에 대한 투자를 거의 끝낸 단계"라고 말했다.
▶[검은 新시장 아프리카] 시리즈 전체 보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이 같은 평가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L사의 현지 지사장은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미지의 시장이라고 떠드는 모양인데 석유가 나올 만한 곳은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말뚝을 다 박아놨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력 부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D사 관계자는 "아프리카 내 KOTRA 무역관이 설치된 곳은 7개 국가에 불과해 기본 정보를 얻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국교 관계가 수립된 아프리카 53개국 중 대사관이 설치된 곳은 16개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아프리카는 거의 프랑스어권이지만 현지 외교관 중 제대로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비공식 외교 채널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형식적으로 기업이 진출하지만 대부분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정치적 리스크와 급격한 경기 변동의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1990년대 말 앙골라에 대한 '컨트리 마케팅'을 시도했고,대우도 1970년대 섬유와 건설,타이어 등 전 산업부문에 진출했지만 자금 부족과 정부 지원의 부재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한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한 아프리카 현지 기업인들의 평가다.
튀니지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수단과 앙골라 등지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바셈 루킬 푸노(FONO)사 사장은 "중국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거의 30년 동안 공을 들였다"며 "프랑스와 미국,영국도 잠재적 시장가치가 크거나 원유생산국인 곳에 대한 투자를 거의 끝낸 단계"라고 말했다.
▶[검은 新시장 아프리카] 시리즈 전체 보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이 같은 평가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L사의 현지 지사장은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가 미지의 시장이라고 떠드는 모양인데 석유가 나올 만한 곳은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말뚝을 다 박아놨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력 부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D사 관계자는 "아프리카 내 KOTRA 무역관이 설치된 곳은 7개 국가에 불과해 기본 정보를 얻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국교 관계가 수립된 아프리카 53개국 중 대사관이 설치된 곳은 16개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아프리카는 거의 프랑스어권이지만 현지 외교관 중 제대로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비공식 외교 채널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형식적으로 기업이 진출하지만 대부분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정치적 리스크와 급격한 경기 변동의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1990년대 말 앙골라에 대한 '컨트리 마케팅'을 시도했고,대우도 1970년대 섬유와 건설,타이어 등 전 산업부문에 진출했지만 자금 부족과 정부 지원의 부재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