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7:46
수정2006.04.03 07:47
박영택 < 성균관대 교수·컴퓨터공학 >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정확한 연대를 알수 없지만 배의 역사가 그만큼 장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9세기 동북아 해상을 장악한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11세기 중반 영국을 지배한 바이킹족,16세기 스페인의 무적함대,유럽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해전으로 남아있는 1805년의 트라팔가 해전 등에서 보듯이 바다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었다.
수천년이 넘는 배의 역사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범선(帆船)은 그 중심에 있었다.
15세기 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탄 산타마리아호,16세기 세계일주에 나선 탐험가 마젤란이 사용한 5척의 선박,1620년 미국 신대륙으로 청교도들을 실어 나른 메이플라워호,19세기 자연과학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찰스 다윈이 탔던 비글호 등은 모두 범선이었다.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 대신 기계를 이용해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선(汽船)이 나오고부터다.
1807년 미국의 로버트 풀턴이 개발한 증기선 클레몬트호가 뉴욕에서 알바니까지 허드슨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항해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기선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범선에서 기선으로의 전환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선주들은 '바람은 아무리 이용해도 무료인데 무엇 때문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다.
화물을 적재해야 할 공간에 대형 엔진과 그것을 돌리기 위한 막대한 양의 석탄을 적재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했다.
각기 다른 범선의 특성상 선원들의 기량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므로 선원들은 선박에 대해 생사를 같이할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
그 때문에 선원들은 설계시 기계적 성능이 미리 결정되는 증기선을 수용하는데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증기선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범선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져갔다.
무풍지대로 들어가면 며칠씩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범선과 달리 증기선은 운항이 확실하게 보장됐다.
또한 증기선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지그재그로 움직이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직진할 수 있다.
증기선이 개발된 지 100년이 지나자 범선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범선이 오대양을 누비던 300년 동안의 전성기보다 증기선이 출현한 이후 50년 동안 범선의 성능이 훨씬 더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는 사실이다.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전에 없던 개선이 이뤄져 얼마간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음에 올 자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는 것을 '범선효과'라고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2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생산경제'에서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며 우리나라도 이미 50%를 넘어섰다.
미국 와튼스쿨의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자동화와 정보화로 인해 앞으로 20년 후면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현재의 5%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무결점(ZD)운동,싱글 PPM,6시그마 등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불량률이나 결함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벌인 품질혁신 운동은 2차 산업 중심의 생산경제 시대에는 큰 힘을 발휘했지만 서비스경제 하에서는 단순히 결함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
범선효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품질혁신도 결함이 없는 상품을 제공한다는 방어적 태도를 벗어나 고객의 감성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적극적 입장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신품질을 제창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신품질포럼 포상분과위원
![[한경에세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몰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토요칼럼] 저금의 재발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424728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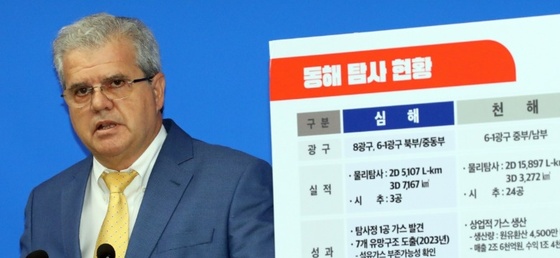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뉴욕증시-주간전망] 연준, 물가 보고서와 애플](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7517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