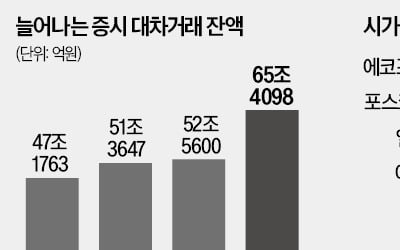I P O 기업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내년 부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공개(IPO)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가 상장시기 결정을 어렵게 하고 감사보수 인상을 초래하는 등 기업들의 상장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돼 내년부터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기업들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받은 외부감사(회계법인)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문제가 있다며 폐지됐으나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다시 부활됐다.
증권사와 IPO 준비업체들은 이 제도가 상장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당초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제도가 부활됐으나 회계시스템을 잘 갖춘 우량 기업들에까지 일괄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의 기업금융(IB) 담당자는 "기업공개는 시장상황 등에 따른 타이밍이 중요한데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때문에 사실상 1년 전에는 IPO를 결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외감법 적용을 받는 12월 결산법인이 계획에 없었다가 시장상황이 좋아져 연말 상장을 목표로 그해 6월께 상장심사를 신청하려고 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 결산내역을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내년도 상장을 추진하는 롯데쇼핑의 경우 올초 감사계약을 체결한 삼정회계법인과의 계약을 깨고 최근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딜로이트안진과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경쟁입찰이 아니라 무조건 지정해주기 때문에 회계법인들이 요구하는 감사 보수가 평균 1.5~2배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지나치게 감사 보수를 많이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해 재신청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지정을 받은 감사법인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까닭에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해도 거부할 방법이 없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IPO기업에 대해 감독당국이 감사인을 강제로 할당해주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시대흐름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재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은 "기업공개는 몇몇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연관돼 있어 졸속결정이 아닌 최소한 1~2년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다소 불편할지 몰라도 투자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