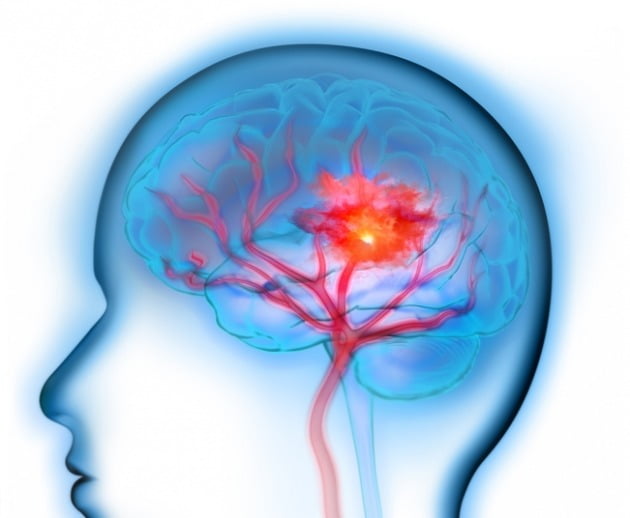8·15 광복절 대사면을 놓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650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는 차치하고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번 사면의 목적 자체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생계형 민생 경제 사범을 대사면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겠다는 여권의 취지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현실성 없는 법규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된 사람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국민 네 사람 중 한 사람꼴로 범법자가 돼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사면을 통해 창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려 올 10월 선거와 내년 지자제 선거에 대비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은 옳지만 사면 또한 정치행위인 한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정작 문제는 정치인 사면이다.
여권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인사들이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정상으로만 본다면 상당수가 자신의 선거도 아닌 대선을 주도했다 법을 위반해 '희생양'이 됐으니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만하다.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여권으로서는 영어의 몸이 된 '대선 공신들'에게 '마음의 빚'이 클 수밖에 없음 직하다.
한 당직자는 "여권이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는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럼에도 정치인 사면은 여권이 정권출범 때부터 누차 강조해온 깨끗한 정치 구현과는 정면 배치된다.
생활사범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사면추진의 명분과도 거리가 멀다.
게다가 '차떼기' 등의 불법대선 자금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국민들 뇌리에 아직도 생생한 터다.
여기다 개인비리와 연관된 측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대목에서 '정치인 끼어넣기 사면' '측근 봐주기 사면'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여권이 너무 무리하게 사면을 추진해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은 별개로 치더라도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만 따지다 국민화합과 지지 모두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창 정치부 기자 leejc@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한경에세이] 이타적 선택의 역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8500802.3.jpg)
![[다산칼럼] '20살' 국내 PEF에 주어진 과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34201783.3.jpg)
![[차장 칼럼] 머스크가 장관 못하는 나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1576685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