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02
수정2006.04.02 21:05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가치가 달러에 비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시장에서 1천원을 주고 1달러를 살 수 있던 상황이 이제 9백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수출이나 원자재 수입을 통해 늘상 달러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세자릿수 환율 시대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기업의 실적 전망을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는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환율과 기업 실적 간의 관계가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첫번째는 가격경쟁력에 관한 부분이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은 물론 일본 대만 등 타 국가들과 수출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출 단가다.
동일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품이라면 아무래도 수입국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게 마련이다.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엔·달러 환율은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원화만 나홀로 강세를 유지하면 달러로 환산한 국내 기업의 수출가격이 올라가는 셈이어서 팔기가 힘들어진다.
요즘처럼 달러 약세 국면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의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다.
두번째는 외환차익(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다.
밀 옥수수 등 원재료 수입이 많은 음식료 업종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원재료 수입 시점에서 맺은 달러시세와 실제 인도 시기가 돼 대금을 결제해야 할 때 달러시세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국내 음식료 업체는 외환차익을 거두게 된다.
특히 외환차익은 장부상의 이익이 아니라 수중에 현금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화환산 이익은 환율 변화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번째 경로다.
이는 주로 달러표시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에 해당된다.
달러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갚아야 할 부채가 줄어들어 해당 기업은 쾌재를 부른다.
다만 이 같은 이익은 장부상의 평가이익일 뿐이다.
달러가치가 떨어진 때를 이용해 부채를 갚아버리면 이익을 챙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채를 다음해로 넘겼는데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는 얘기다.
이원선 대우증권 과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환율 노출도를 줄이기 위해 선물환거래 등 각종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적이 크게 변동되지는 않는 편"이라면서 "환율과 같은 외부 변수에 상처 입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버크셔 주가 장중 99% 폭락?…전산오류에 거래소 소동 [뉴욕증시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25625.3.jpg)
!['월 50만원씩' 30년 굴리면 통장에 7억이…비법 뭐길래?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2316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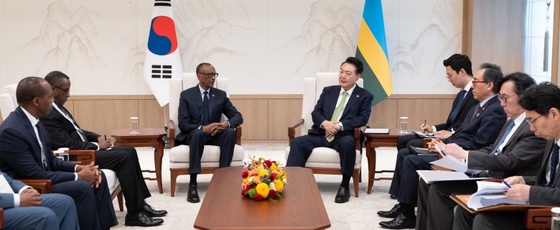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