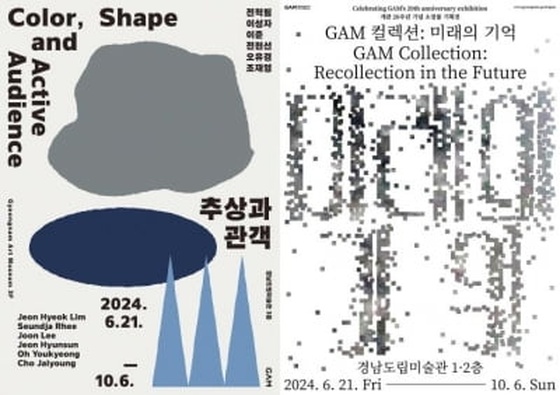입력2006.04.02 16:54
수정2006.04.02 16:57
케이블TV를 보다 보면 도중에 두세 번씩 채널을 돌리게 된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라는 자막에 이어지는 중간광고 탓이다.
리모컨으로 다른 채널을 둘러보지만 시청 흐름이 깨져 짜증나고 피곤하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의 중간광고는 흥미 유발을 위해 극적인 순간에 삽입돼 스트레스성 긴장감마저 일으킨다.
지상파 TV방송의 중간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온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개중엔 휴식이나 작전시간이 있는 스포츠·예술 프로그램 외엔 금지돼 있는 중간광고를 허용하자는 입장도 있다.
디지털방송을 위한 재원 마련도 시급하고,프로그램 구성의 다양화 및 광고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찬성론보다는 반대론이 거세다.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 허용하고 있다곤 하나 공영방송에서 하는 곳은 없고 시청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간광고를 하게 되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는 건 물론 가뜩이나 심한 시청률 경쟁을 가속화시켜 저질 프로그램만 늘어날 뿐이라는 주장도 많다.
이런 이유로 2000년부터 계속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철회됐다.
2001년엔 방송위에서 나서서 민영방송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거둬들였고,2003년 7월에도 방송위가 중간광고 허용과 광고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의 10%에서 20%로 늘리는 규정을 신설하려다 좌절됐다.
디지털방송의 본격화를 앞두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 악화로 사정이 어려운 건 지상파방송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간광고 없이도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수입은 막대하다.
방송광고 시장은 95년 1조4천7백57억원(TV와 라디오 합계)에서 2004년 2조5천억원으로 69.4%,연간 7.7% 증가했다.
인쇄매체 광고 증가율은 급감했지만 95년 이후 지상파방송 광고비가 GDP에서 차지한 비율은 일정했다.
지상파 TV는 케이블TV와 달리 불특정다수에 제공되고 한정된 전파를 사용하는 만큼 공익성을 띤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면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경영 효율화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지 중간광고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한경에세이] 교육혁신, 사라지는 연수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아르떼 칼럼] AI가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036337.3.jpg)
![[천자칼럼] 30년 만에 수출 꿈 이룬 K고속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361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