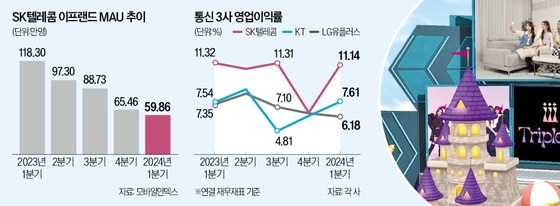입력2006.04.02 11:26
수정2006.04.02 11:29
"바세나르 협약은 깨졌습니다."
헤이그에서 만난 잔 브링크호르스트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이 툭 던진 말에 필자는 뒤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노ㆍ사 화합모델의 전형으로 네덜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이 협약이 깨지다니….
1990년대 장기호황을 누리던 네덜란드 경제가 2001년부터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2003년 마이너스 성장(-0.8%)을 보이자 지난해 10월 노ㆍ사ㆍ정은 향후 2년간 임금을 동결키로 하는 내용의 '제2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조기퇴직 가능연령 등 세부사항에 이견이 생겨 노조측이 이 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노·사 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다.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적이기 때문이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경제는 이 갈등 구조가 화합으로 조정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
유럽강소국들은 이떻게 갈등을 화합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노조의 경영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약간 다르다.
네덜란드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책 방향이 설정되는 관행을 갖고 있다.
이것이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듯 한데,실제 기업경영에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핀란드도 마찬가지다.
스웨덴의 경우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영권 참여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들은 경영진의 의사를 노조측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는가.
핀란드경제연구소 파시 소르요넨 경제분석팀장은 핀란드 국민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을 지적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국민의 지속적인 투쟁 과정에서 강한 애국심이 형성됐고,이것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화합을 유지하게 한다."
이런 공동체 의식의 발로는 네덜란드도 비슷하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상당부분이 해수면 보다 낮은 간척지다.
폴더(polder)라고 불리는 이 땅은 네덜란드 국민의 자연에 대한 공동투쟁의 상징이다.
네덜란드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폴더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서 유래한다.
1980년대초 노사대립,재정적자 등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을 '네덜란드의 기적(Dutch Miracle)'으로 바꿔 놓은 바세나르 협약도 그같은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동체 정신과 타협 문화의 밑바탕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잘 지켜져 온 이 나라들의 정신적 유산이 깔려 있다.
이들에겐 왕과 귀족들이 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운 역사가 있다.
현역 여성 법무부 장관이 병실이 꽉 차서 병원 복도에서 산고를 치러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총리 부부가 수행원 없이 지하철을 타고 영화관을 찾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나라에서 계층간 불화가 생길 수 있겠는가.
핀란드를 대표하는 정보통신 회사 노키아의 테이자 쇼스테트 인력팀장은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와 이러한 여건에 맞춰 구축될 수 있는 투명한 기업이 노·사간 타협을 쉽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 없는 나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인정한 핀란드의 풍토에서 타협과 화합은 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가 정치성을 띤 투쟁을 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세나르 협약의 정신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극단적 대립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깨졌다(Broken)'는 말에 어리둥절해 한 필자에게 브링크호르스트 장관은 꽤 자신있게 말했다.
헤이그(네덜란드)·헬싱키=김광두 서강대 교수·국가경쟁력연구원장 kinc@mail.sogang.ac.kr
---------------------------------------------
◆편집자주=국가경쟁력연구원은 '국가경쟁력 플랫폼' 산하 연구원입니다.





![뉴욕증시 또 사상 최고…AI 베일 벗은 애플은 1.91% 하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1062607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