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1000 시대 열자] 제2부 : (1) 로또식 투자문화
이모(42)씨는 1년전만해도 실험기구를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체 "사장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영세기업에서 단순노동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씨가 이렇게 된 것은 "대박"을 노리고 선물.옵션에 손을 댔다가 "쪽박"을 찼기 때문이다.
재미삼아 주식투자를 하던 이씨는 지난 2001년 미국 9.11테러참사 직후 선물.옵션시장에서 수백배짜리의 "대박"이 터졌다는 보도를 보고 손을 댓다 사업자금을 모두 날려 버렸다.
전업 투자자인 김모씨(36)도 한때 대형 증권사 근무 시절 선물·옵션 시장의 '큰손'으로 통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 몇몇 '큰손'들이 시장을 주무르던 97,98년 수십억원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커진 데다 첨단 기법으로 무장한 '꾼'들과 자금력을 앞세운 외국인과의 승부에서 패해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어찌보면 '봉'인지도 모른다.
금융감독원과 증권 업계는 지난 200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6개월 동안 개인이 선물·옵션 시장에서 날린 돈이 1조6천5백1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5천47억원이 털렸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은 9천7백12억원을 챙겼다.
시장이 들어선 지 7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거래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빚은 결과다.
봉원길 대신증권 선임연구원은 "9·11 미국 테러 참사 이후 국내 선물·옵션 거래량이 10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주문 실수나 대형 사고로 대박이 날 때마다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로또식 투자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현물인 주식투자라고 해서 사정이 나은 것은 아니다.
개인이 사면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패턴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개인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거래소시장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 게 이를 말해준다.
개인의 초라한 투자성적표는 '단타'(단기매매)와 루머(풍문)를 좇아다니는 그릇된 투자문화에서 비롯됐다.
국내 개인들은 단타에 관한 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는 '단타족'들이 애용하는 온라인(사이버) 거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증권업협회가 집계한 올 상반기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약정금액 기준)은 53.2%로 전체 거래 규모의 절반을 웃돈다.
온라인 거래 비중은 △4월 50.4% △5월 53.1% △6월 53.3% △7월 67.9%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비해 일본의 온라인 거래 비중은 21.6%(작년 하반기 기준),미국도 20∼30%에 불과하다.
주식 회전율(거래량/발행주식) 면에서도 한국은 '금메달감'이다.
지난해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된 기업의 회전율은 5백71.9%와 8백94.4%에 달했다.
이론상으로는 작년 한 해 동안 거래소 상장기업의 주인은 5번 이상,코스닥 등록기업은 9번가량 바뀐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루머 좇기'와 '묻지마 투자' 면에서도 선수급이다.
'슈퍼 개미' 소동으로 상당수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홍역을 치른 것이 실례다.
퇴직 임원의 지분변동 신고가 경영권을 넘보는 '큰손'의 출현으로 둔갑하고 대주주 지분이 62%인 기업이 적대적 M&A 대상으로 지목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자금과 정보로 무장한 외국인 앞에서 단기투자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증권 신성호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을 저축이나 투자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일확천금을 노린 단기매매와 루머(테마) 추종주의를 고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북한산뷰'에 호텔급 헬스케어…보증금 3000만원에 살 수 있다?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85883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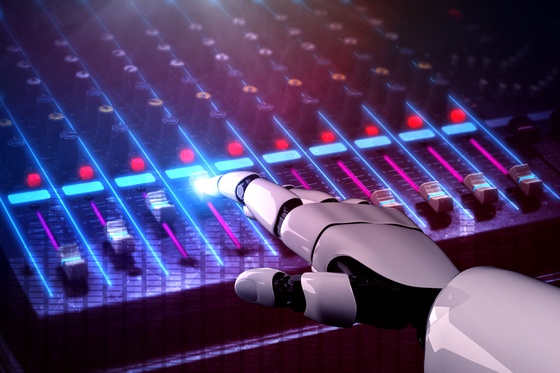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