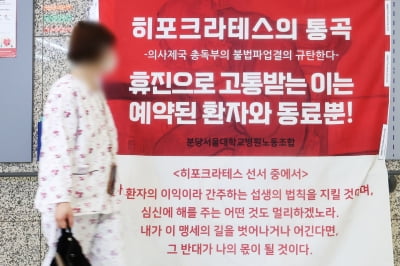입력2006.04.02 04:35
수정2006.04.02 04:38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교육자치의 대수술에 나선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발전'이란 참여정부 핵심 공약에 입각한 것이다.
교육자치제도가 개혁의 타깃이 된 것은 선출직 교육감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이 시·도의 일반행정과 전혀 별개로 이뤄짐으로써 교육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지난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뉴타운지역에 특수목적고 등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이 반대, 추진이 어려워졌다.
현행법상 특목고 인가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
행정과 교육이 결합되면 전체 예산틀 속에서 지자체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교육감 선거제도 역시 시급한 개혁대상이다.
교육감은 인사권을 비롯해 예산편성, 집행 등 광역 시ㆍ도의 교육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막강한 자리지만 시ㆍ도별로 3천∼1만4천여명에 불과한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로 뽑는다.
이렇다보니 역대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간 담합, 매수, 향응제공 등 정치판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이 판쳐왔다.
교육개혁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교육감 및 교육위원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전교조 등도 우호세력만은 아니다.
전교조, 교총 등은 교육감 선거제도 변경에는 공감하지만 교육과 일반행정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교육을 일반행정과 통합하면 교육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환영한다.
지방분권위는 오는 7월 공론화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어서 올해 서울 대전 충남 전북 등 4개 시ㆍ도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현행방식대로 간접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렇게는 못 살겠다" 2030 몰리더니…주민들 분노 터졌다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564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