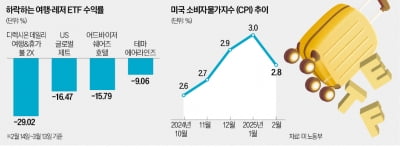[中企 환위험에 '비틀'] 換헤지 하려해도 선물환 힘들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반도체소재 제조업체인 K사의 김모 재무담당 이사는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출렁거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원ㆍ엔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마다 이 회사의 재무적인 부담도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차입금 가운데 약 60%가 엔화 차입이다.
2001년 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으로 원화차입보다 금리가 낮은 엔화 대출을 선택했다.
차입금리는 연리 기준으로 시설자금 3.3%, 운전자금 4.6%로 가중평균 3.8%였다.
이 금리로 10억엔을 1백엔당 9백80원 수준에서 매년 일정부분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년짜리 장기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엔화 강세가 이어져 지난해말 원ㆍ엔 환율이 1백엔당 1천1백20원 수준까지 올라 이 회사는 지난해 16억원의 외화환산손실을 입었다.
환율 상승을 감안한 실질 차입금리는 18.1%에 달한다.
보다 심각한 것은 갚아야할 원금 자체가 14.3%나 증가했다.
김모 이사는 "최근들어 환율이 1백엔당 1천40원대 수준까지 떨어져 그나마 다행이지만 언제 엔화 강세가 다시 시작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입시점에서 선물환 매수나 외환스와프 등을 활용해 환헤지(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를 했어야 했다"며 "문제는 지금와서 환헤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환산손실이 고스란히 확정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단지 원ㆍ엔 환율이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 환위험에 무방비로 노출 =K사처럼 환위험관리를 제대로 못해 곤경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많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수출입 외화차입 등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위험을 관리하는 업체는 25.4%에 불과했다.
경기도 시화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수출업체인 L사는 매출채권중 절반이 외화자산이지만 환관리를 거의 해오지 않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4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이익은 19억원에 불과했다.
외환순손실이 31억원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소ㆍ벤처기업위주인 코스닥등록업체들 가운데 4백10개 업체가 지난해 환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못해 모두 1천3백9억원의 외환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모두 6백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환위험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6백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수도 있었던 셈이다.
◆ 환관리 여건 안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환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환관리하기가 대기업에 비해 불리하고 실질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한다.
L사 대표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들에 선물환거래를 잘 안해주고 보증금과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불평했다.
중소기업들은 거래규모가 소액이고 신용도가 낮아 불이행 위험성이 높다며 은행들이 선물환거래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L사 대표는 "현물환율에서도 대기업에 비해 한번 거래할 때마다 달러당 5∼10원 가량 불리하다"며 "선물환거래를 하면 계약과 청산시점에서 두번의 거래를 하게 돼 달러당 10∼20원을 손해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환위험 관리에 내부적으로 드는 비용도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수천만∼수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환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환관리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존 직원을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키우려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김홍경 중진공 이사장은 "최근들어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최고경영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