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3:59
수정2006.04.02 04:02
지금까지 독재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이랬다.
권력을 독점한 소수가 폭력과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다수의 무고한 민중을 억압하고 지배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대중 독재'(mass dictatorship)는 독재론에 대한 이런 논리를 거부하면서 새롭게 제창된 개념이다.
이 개념 골자는 권력에 복종하고 억눌리며, 핍박받던 대상으로만 간주되던 대중이란 실체를 주체적으로 끌어올려, 독재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중독재론은 대중이 독재와 결합하는 과정을 어떻게 상정할까? 대중독재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강제와 동의'(coercion and consent)를 주목한다.
즉, 대중은 권력을 독점한 소수에게 강제되거나, 또는 독재에 암묵적 혹은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함으로써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중독재론을 증명하는 가장 비근한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나치즘 체제에서의 독일 대중과 박정희 체제에 대한 한국 민중(국민)의 태도이다.
나치즘은 당시 독일 국민 대다수가 선거를 통해 택한 체제였으며, 박정희 체제또한 그 반대자만큼이나 지지자 또한 적지않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한다.
한국과 외국의 역사학자 19명이 공동으로 엮은 책 「대중독재 :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는 그 역사가 짧아 아직까지 생소한 '대중독재론'을 비교사적인 관점에서여러 독재 체제를 검토함으로써 그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집약된 대중독재론은 지난 10월 한양대 인문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강제와 동의 : 대중독재에 관한 비교사적 고찰' 성과를 다시금 재정리하고 있다.
당시 참여자, 특히 일부 외국 역사학자는 한양대 사학과 임지현 교수가 주도하는 대중독재론을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일부 반대론자는 대중이 독재에 자발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동의했다는 대중독재론에 대해 '내면화된 강제' 혹은 '비가시적 폭력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현상을독재에 대한 자발적 지지 혹은 동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책 서문에서 임 교수 스스로가 토로하듯이 대중독재론이 독재권력이 아니라 민중에게 책임을 떠안기고자 하는 논리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떻든 이번 책은 나치즘과 파시즘, 스탈린주의는 물론 스페인의 프랑코이즘,동독과 폴란드의 현실 사회주의, 비시정권 하 프랑스, 박정희 시대 및 일본의 총력전 체제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대중의 역학 관계를 심층 고찰했다.
집필자마다 적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하나, 어쩌면 그 자체 독재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권력이 대중 혹은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냄으로써 그들을국가 권력이라는 테두리에 가두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책세상 刊. 592쪽. 2만5천원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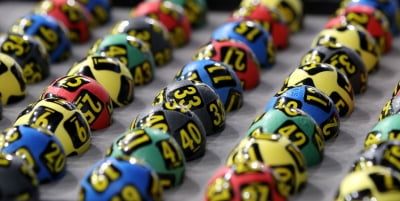




!["심각한 고평가"…AI 서버 수요 의심 커졌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1065547707.jpg)








